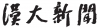편집인 겸 주간│이 현 복 <인문대·철학> 교수
대학 시절,
대학신문과 기자는 참으로 매력적이었다. 그때 그 시절 대학 내 의사소통 매체로는 유일한 것이 학교 신문이었으니, 신문이 나오는 날이면 누가 무슨
글을 썼는지 살펴보는 것도 적지 않은 즐거움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신문사 기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 그들을 부러움의
눈으로 보았던 시절이 있었다.어떤 신문이든 간에, 이제 신문은 그 효력을 점점 상실해가고 있음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인터넷이라는 새천년의 유령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지금, 활자 매체는 그 편리성과 순발력 그리고 유연성에서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더욱 가볍고, 더욱 빠르고, 더욱 편안한 것을 선호한다. 활자 매체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아무리 피력해도 이미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사람들은 그 무거움에 고개를 돌릴 것이다.
한대신문사 주간을 맡은 지도 한달이 넘었다. 그 동안 개념기념 특집호를 비롯해 신문이 몇 번 발행됐다. 신문제작에 지극히 문외한이 사양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덥석 자리를 잡고 보니 그야말로 갑갑 그 자체였다. 모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귀동냥, 눈 도둑질을 하면서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릴 참이다. 이쯤에 대학신문이 무엇이어야 할까 자문해보곤 한다. 재벌급 일반 신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때, 대학 신문의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물어본다.
그랬다. 기자라고는 하지만 이제 막 입학한 수습기자들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기껏해야 한 두 학기 기자 경력의 소유자라는 것이 한대신문사의 현재였다. 서너 명의 기자들이 쓴 기사들로 대부분의 지면이 채워졌으니 질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무리일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둔 채 수수방관하기에는 왠지 좀 기분이 상한다. 많은 학교 예산이 투입되는 신문이 휴지조각으로 돌아다니는 것에, 또 먹다 남은 자장면 그릇 덮개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에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어린 기자들이 수업 빠져가며 밤새면서 취재하고 작성한 그 몸부림의 흔적들이 독자를 구하지 못한 채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어쩌겠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클릭만하면 보고 싶은 것이 단번에 뜨는데 누가 귀찮고 힘들게 종이를 펼쳐들고 있겠는가. 또 교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어찌 한대신문뿐이겠는가. 수요자가 신통치 않으니 공급자 역시 맥이 풀리는 것 또한 인지상정이다. 이 와중에 가엾은 것은 죽어라하고 기사를 만드는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학생기자들뿐이다. 어김없이 기사 마감시간은 다가오고 예정된 날짜에 신문은 그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린다. 고생에 대한 대가도 별반 없는 이 짓거리를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한다. 그것이 대견하고 고맙다.
한대신문이 찬밥에 애물단지 신세를 면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누구도 아닌,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자신을 위해 한대 신문은, 대학신문은 그리고 신문은 재생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대신문은 ‘신문’이어야 하고, 그것도 ‘대학’ 신문이어야 하며, 나아가 ‘한양’ 대학신문이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너무 뻔한 것이라서 지금껏 외면당하고 간과됐던 것일까. 18세기 철학자 흄은 말한다. “철학자가 되라, 그러나 당신의 철학 한 가운데에 인간이 있게 하라.” 이것이 이 인터넷 시대에 신문이, 한대신문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 필요조건이라는 점이다. “기자가 되라, 그러나 당신의 기사 한 가운데에 한양이 있게 하라.” 그래서 정보와 홍보와 계몽이 살아 숨쉬는 신문,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