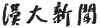바람이 분다. 내가 머물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같은 바람이 다르게 분다.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시원하다. 바람은, 그렇게 불어 갔다가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렇게 난 늘 바람 속에 서 있거나, 바람 속을 걷고 있다. 머릿속에도 바람 한 편 스쳐 지나갔으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신입생 또는 새내기, 아니면 동생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후배.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릴 때 ‘나’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내 못난 표정과 웃는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솔직히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금 서운하지만, 사무치도록 후회스럽진 않다. 나름대로, 또는 그럭저럭 잘 지내온 탓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이 물음에 대해서, 지금은 판단을 미루어야 할 때.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언제나 젊기에.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후배님, 동생, 형, 누나, 선배, 선배님, 선생님.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저기요.”라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길지 않지만 결코 짧지도 않은 혀로 상처를 주는 얼굴이었을까. 아니면 끈적거림과 비굴함이 잔뜩 묻은 얼굴로 달콤함을 건네는 혓바닥의 표정이었을까. 솔직히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지만, 애써 지난 날을 망각한 몸짓을 보인다. 이 태도에 대해서, 지금은 살펴보아야 할 때. 더 이상 성찰을 미루어서는 안 될 때. 되돌아보고 반성하기에, 우리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젊다.
바람이 분다. 뭔가 다르다. 이번 바람에는 푸른색이 묻어 있다. 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들어 있는가, 여전히 푸른가. 언제나 우리는 살아 꿈틀거릴 수 있기에, 이 물음은 오래도록 간직해도 좋을 것 같다.
바람이 여전히 분다. 그 투명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둠 속에 유난히 빛나는 별과 함께 별빛을 위해 끊임없이 묵묵해지는 어둠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눈과 빛, 지금 내 가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서적의 단단함을 꿰뚫었을 때에만 비로소 갖출 수 있는 그 눈빛.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리고 바로 ‘나’가 지녀야 할 그 무엇.
곁에 있는 누군가 나를 부른다. 아빠, 여보, 형, 선배님, 선생님,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젊지만 마냥 어리진 않음을 새삼 느낀다. 어깨가 조금 무겁다. 그와 함께, 길지 않은 두 다리에 힘이 가득 실린다. 어디에 있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제 겨우 조금 알 것 같다. 인문학의 위대함이여. 모든 학문의 찬란함이여.
불어 오가는 바람과, 내 가슴 속에 고요히 품고 있는 바람은 다른 뜻을 지녔지만 같은 이름을 가졌음을 깨닫는 밤.
일곱 마디의 바람
- 황성규 <국어국문학과 동문>
- 승인 2014.03.10
- 호수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