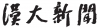모처럼 옛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다. 스승의
날을 핑계 삼아 옛 스승을 찾아뵙고 약속이나 한 듯 찾아온 친구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는 모습도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울지 모른다. 과거
우리 조상이 제사를 통해 사후에도 자손들을 한자리에 모았듯, 교사가 스승의 날을 통해 졸업한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의미 역시 퇴색될 위기에
있다. 오늘로 25회를 맞이하는 스승의 날에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의 59%가 휴교를 했다고 한다. 과거 관행처럼 여겨졌던 스승의 날 촌지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게 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아예 휴교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덕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고자 마음을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성적우선주의, 개인이기주의 등 그릇된 교육문화로 인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물질적인 대가를 치르고 역으로 그 반사이익을 취하는 행사로 변질됐다.
우리 대학사회를 살펴보자. 과연 대학에 스승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학점우선주의, 취업만능주의 등으로 인한 대학사회의 변질로 인해 학생들은 교수들로부터 학점을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과 교수가 학문을 두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주관식 문제의 답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 전화로, 혹은 이메일로 논쟁하고 있다. 또한 휴강을 쟁취하기 위한 갖은 애교들이 강의실에 등장하고 있으며 학교 게시판에는 학생들의 무성의한 수업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눈에 띈다.
과연 성적·생활과 관련한 부분에서만 사제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미 대학사회에서 학생과 대학본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학생이 학문적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학문의 전달자로서 학생들을 존중하는 환경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수와 학생은 강의실이 아닌 등록금 협상장에서 머리를 마주하고 토론하며 서로간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차치하고 학생들이 교수들의 발을 묶는 행위를 한다거나 교수들은 학생들을 출교 조치하는 환경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여기서 사안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이 사회의 어떠한 구조적 모순이 학생과 스승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은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해 무조건적인 적대의식을 갖게 됐다. 어려서는 복종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으며 조금 더 성장해서는 억압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금 진보와 보수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 돼버렸다.
스승과 제자의 개념을 만들어 내는 가장 전통적인 수단은 학문을 매개로한 만남이다. 하지만 대학사회가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랜 상황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의 무의미를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모임까지 등장했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회에 의해 잘못 정의된 사제 관계 개념과 교육문제해결이지 스승의 날을 폐지하는 미봉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에만 존재하던 촌지가 1년 365일 내내 상시대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사제 관계를 이렇게 까지 만들어버린 교육환경의 문제와 스승의 날 의미를 퇴색시킨 사회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들의 스승의 날’은 영원할 것이다.
스승의 날은 스승의 은덕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고자 마음을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성적우선주의, 개인이기주의 등 그릇된 교육문화로 인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물질적인 대가를 치르고 역으로 그 반사이익을 취하는 행사로 변질됐다.
우리 대학사회를 살펴보자. 과연 대학에 스승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학점우선주의, 취업만능주의 등으로 인한 대학사회의 변질로 인해 학생들은 교수들로부터 학점을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생과 교수가 학문을 두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주관식 문제의 답안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 전화로, 혹은 이메일로 논쟁하고 있다. 또한 휴강을 쟁취하기 위한 갖은 애교들이 강의실에 등장하고 있으며 학교 게시판에는 학생들의 무성의한 수업태도를 비판하는 글들이 눈에 띈다.
과연 성적·생활과 관련한 부분에서만 사제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미 대학사회에서 학생과 대학본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학생이 학문적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학문의 전달자로서 학생들을 존중하는 환경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수와 학생은 강의실이 아닌 등록금 협상장에서 머리를 마주하고 토론하며 서로간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차치하고 학생들이 교수들의 발을 묶는 행위를 한다거나 교수들은 학생들을 출교 조치하는 환경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여기서 사안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이 사회의 어떠한 구조적 모순이 학생과 스승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은 스승이라는 존재에 대해 무조건적인 적대의식을 갖게 됐다. 어려서는 복종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으며 조금 더 성장해서는 억압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지금 진보와 보수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 돼버렸다.
스승과 제자의 개념을 만들어 내는 가장 전통적인 수단은 학문을 매개로한 만남이다. 하지만 대학사회가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랜 상황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의 무의미를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모임까지 등장했을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회에 의해 잘못 정의된 사제 관계 개념과 교육문제해결이지 스승의 날을 폐지하는 미봉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승의 날에만 존재하던 촌지가 1년 365일 내내 상시대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사제 관계를 이렇게 까지 만들어버린 교육환경의 문제와 스승의 날 의미를 퇴색시킨 사회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들의 스승의 날’은 영원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