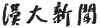대학신문 편집장 이소영
한대신문사의 5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격동의 한국 역사 속에서 대학은 역사의 변화를 주도해왔고 학보사는 언제나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대학은 지성의 상징이자 사회의 비판자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일궈냈으며 학보사는 때로는 그 동반자로, 대학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비판자의 역할을 하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한가운데 대학이 있었다면 대학의 역사 속에는 학보사가 있었습니다. 대학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꼭 그만큼 학보사 역시 사회에서 그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대학은 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대학은 경쟁논리에 종속돼 비판적 지성을 기르기보다는 ‘남을 누르고 살아남는 법’만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회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기업의 하위기구로 취업자양성소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대학생은 갈수록 파편화되며 우리는 ‘우리’를 위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고민만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대학의 위상은 낮아진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과연 학보사의 위기가 대학의 몰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학보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대학이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휩쓸릴 때 같이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혹은 그 물결에서 발을 빼고 팔짱낀 채 방관하며 ‘고고하다’고 자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이제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현실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훈은 “지금도 나는 6하 원칙의 신성함을 믿는다. 다만 6하의 가치와 존엄을 인정하되, 6하로서 충족될 수 없는 진실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깔끔한 육하의 문장보다 ‘더러운’ 현실의 문제를 담아내는 문장. 깔끔하고 쿨하게 사는 사람을 두둔하기보다 힘들고 치사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듬는 것. 조금 서툴더라도 그것이 ‘대학생’인 기자로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기사가 아닐까요. 한대신문사의 앞날을 축복해야 할 자리에 어두운 이야기만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학보사의 앞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동지’가 있기에 그 걸음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대신문사의 52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