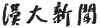고대신문 편집국장 장민석
한양대학교 개교 72주년, <한대신문> 창간 52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의 학보사의 발전을 논하기 전에 취재 일정 중 방문했던 스탠포드대와 미주리대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스탠포드 학보인 <Stanford Daily>는 학생 편집국장이 비영리법인 '(주)Stanford Daily'의 CEO를 겸임합니다. 기사는 학생기자들이 작성하며 편집과 회계 관리는 편집국장이 고용한 전문직 직원이 담당합니다. 재원은 광고비와 학생 지원금, 그리고 법인 재산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으로 마련합니다. 높은 구독률로 인해 학교 주변 상권들이 너나할 것 없이 광고를 사며, <Stanford Daily>는 이러한 수익과 자체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편집국 건물을 지었습니다. 반면, 미주리대 학보 <Missourian>은 학교 저널리즘 스쿨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고용한 직원이 회계 관리와 편집 감수를 맡으며, 재원은 학교가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편집과 경영업무에 학생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광고 디자인이나 지면 작업에는 대개 미래에 그 직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한 곳은 정론직필의 언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다른 한 곳은 자타공인 대학교육의 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극과 극의 구조를 가진 학보사들이 미국 대학에는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학보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딜 가나 비슷한 구조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발전하기보다는 근근이 연명하는 모양새입니다. <Stanford Daily>와 <Missourian>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학보사는 저 둘의 장점을 잘 살리기는커녕 단점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을 받고 학교가 임명한 책임자를 두지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지도 학부 성적에 도움이 되지도 취업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또 자체적인 예산이 일부 있고 특정 단과대에 소속돼 있지도 않지만,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도 예산을 직접 굴릴 수도 없습니다. 한 주 한 주 신문을 내기도 벅찬 상황이지만, 학보사의 모습이 미래에 어떠해야 할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사회 풍토가 다르다는 변명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가 학보사 편집국의 발전을 추진했던가요. 이제는 정말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