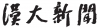최근 화제가 된 영화 ‘서울의 봄’을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 개봉 첫 주의 토요일인 만큼 영화관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팝콘이 준비되는 동안 매점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그때,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나에게 다가왔다. “우리 영화 보려고 하는데 4관이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서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혹시 아세요?”라고 나에게 길을 물었다.
4관으로 가는 통로는 바로 그분들의 뒤에 있었다. 하지만 안내판에는 영문 ‘Entrance’와 상영관 ‘숫자’만 표기돼 있었다. 즉 우리가 영화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5관’이나 ‘상영관’이라고 적혀 있는 한글 안내판이 없어서 그분들이 4관을 찾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 뒤쪽으로 쭉 가셔서 저기 숫자가 적혀 있는 옆 통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 드렸다. 여성분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고, 영어를 잘 몰라서 길을 못 찾았네요. 죄송해요. 정말 고맙네요.”라고 말씀하셨다. 수많은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했던 나는 자연스럽게 “아이고, 아닙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라고 숨어 있는 서비스 정신까지 끌어올려서 그분들이 느끼는 민망함을 최소화하고 싶었다.
그분들이 떠난 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사실 그분들은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를 했을까? 키가 작고 해맑아서 나에게 길을 묻는 분들이 참 많았으나 방금 안내하면서 처음으로 당황함과 공허함을 느꼈다.
이 여성분들이 아니었으면 국내의 대중시설에 ‘한글’이 표기돼 있지 않은 안내판이 존재한단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4개 국어를 하므로 여러 언어가 내 일상에 뒤섞여 있기에 눈에 띄지 않았던 거 같다. 하지만 이분들은 분명히 한국에 계시는데, 영문 안내판을 이해하지 못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
글로벌 교육 기관 에듀케이션 퍼스트(Education First)가 발표한 2023년 영어 능력지수(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의영어 능력은 비영어권 국가 중 49위로 ‘보통’에 속한다. 또한 18~25세와 41세 이상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대중들이 영어가 능숙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편이 아니다. 이에 영어는 한국의 관용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시설 안내판에 영문만 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 것이 확실하다.
안내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내용을 소개하거나 사정 따위를 알리는 판’이다. 그러나 이제 영어를 잘 알지 못하면 안내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는 한글보다 영문을 쓰면 고급스럽고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안내판의 용도보다 시각적인 요소에만 집중하게 되면, 과연 그 안내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최근 해외에서 K-콘텐츠, K-푸드, K-POP의 여파로 인해 가게 간판 및 안내판에 ‘한글’을 추가 표기하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한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웃픈(웃기고 슬프다)’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