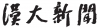서울캠퍼스에 볼일이 있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한양대’에서 내렸다. 수도권 전철에서 유일하게 명실상부한 이름이다. 플랫폼을 나와 계단만 오르면 대학 구내가 나타나니 말이다. 이 역이 올해로 생긴 지 40년이다. 저편의 세월 속에 지금의 나를 만든 사연도 있다.
‘서울의 봄’과 함께 대학에 입학했다. 저 한 많은 1980년의 봄이다. 한 달쯤 학교에 다녔나, 대학마다 거리마다 데모의 인파가 넘쳐나고, 곧 계엄사로부터 휴교령이 떨어졌다. 한 학기 내내 집에서 쉬었다. 코로나 사태로 얼마 전 20학번이 겪은 바와 닮았다. 다르다면 비대면 원격강의가 없었고, 학교 안팎에 얼씬도 못 하게 했다는 점이다. 학기말에 얼기설기 리포트를 써 내자 한 학기 점수를 매겨주었다. 참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시절이었다.
가을학기 들어 교문이 열렸다. 캠퍼스 도처에 사복 경찰이 은밀히 돌아다니니 면학 분위기가 어떠했겠는가. 일찌감치 학교를 접고 지하로 숨어드는 친구도 있었다.
숨 막히고 삭막해도 트이는 구석 또한 있는 법이다. 교문 앞 수복분식의 인심이 풍부한 만큼 대학 생활에 조금은 정을 붙여 나갔다. 문과대학 올라가는 계단이 그때는 122개였고, 만만찮은 높이만큼 우리도 그만큼 쌓아 올리는 세월의 켜를 느끼는 것이었는데, 행당 캠퍼스는 그 무렵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되어 산만했다.
슬며시 찾아온 고통이었다. 문과대학 건물 아래로는 터널 뚫는 공사를 하는지 가끔 충격음과 함께 몸이 흔들렸다.
더 큰 문제는 통학로였다. 내가 살던 집은 신촌 쪽이었는데, 학교까지 오는 버스는 2호선 공사 구간과 거의 일치했다. 지금과 달리 지상에서 파고들어 가는 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는 반쯤 공사장으로 헌납하고,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길이 출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이나 다를 바 없었다. 1시간 거리가 2시간을 잡아도 겨우 맞출 정도였다. 학교가 열려 그나마 시작한 대학 생활이 통학 시간마다 치르는 지옥 경험으로 물들었다. 요즘 김포의 골드라인이 이와 같다 들었다.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이른 버스를 타고 밤이 늦어서야 귀가하였다. 아마도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5시간은 되었던 것 같다. 할 일이 달리 무엇이겠는가. 수복분식의 막걸리를 비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지금은 옛 강당 자리에 선 백남학술정보관이 그때는 중앙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정문 가까이 있었다. 그래서 학과 일정이 끝나면 신촌 가는 막차 시간까지 저녁 내내 도서관을 지켰다. 하다 하다 국어사전을 노트에 베끼기도 했다. 참말로 기특한 학생이었다.
2호선 공사가 4년 만에 끝났다. 저 지긋지긋한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 만든 지하철로 상쾌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달랑 졸업장 한 장이 쥐어졌다. 지하철 공사와 함께 나의 대학 생활도 끝났다.
그런데 졸업장 한 장만은 아니었다. 내 손에는 4년간 도서관에서 보낸 저녁의 시간이, 가을날 플라타너스 너른 잎처럼 가득 쌓여 있었다. 그런 시간은 내 눈을 밝게 했으며,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었다. 40년이 지난 지금 돌이키니, 나는 그 길로 걸어온 인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