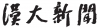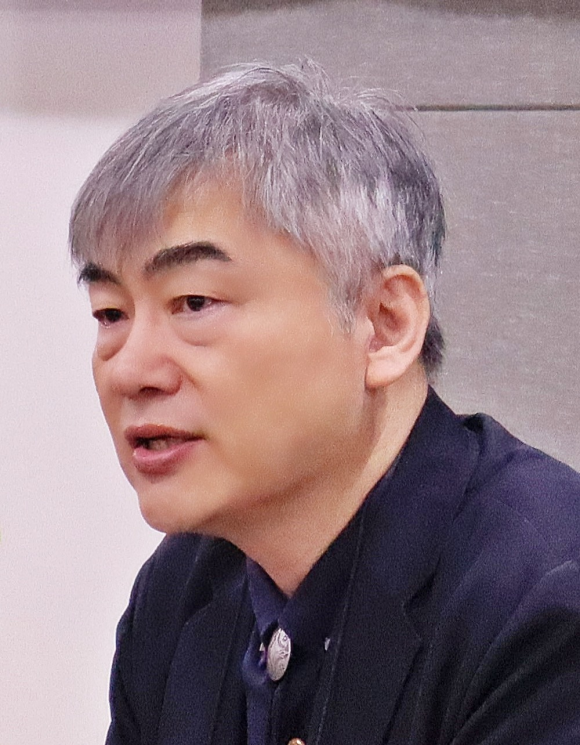
필자는 1964년 왕십리에서 태어났다. 5-6세 때였던가 누님들과 청계천에 있던 나무다리를 건너다 아래로 신발을 한 짝 떨어뜨렸는데, 이후 청계천은 도로로 덮였다가 다시 걷어졌지만, 아직 그 신발은 찾지 못했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마저 왕십리에서 다녔다. 심지어 군대도 하왕십리 동사무소에서 복무했다. 첫 직장인 한양대에서 벌써 25년 차다. 다 합치면 태어나서 60년 전 생애를 왕십리에서 산 셈이다. 시인 김소월의 시, ‘왕십리’의 한 구절처럼 내 인생은 “가도 가도 왕십리(往十里)”다.
필자는 왕십리 똥파리다. 지금은 새로 들어선 아파트들이 즐비한 멋진 거주지로 바뀌었지만, 예전 왕십리는 그렇지 않았다. 조선시대 성 바로 밖에 위치해 성 안으로 공급하는 채소가 재배되었고, 당연히 성에서 나오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왕십리는 똥파리들의 집결소였다. 그래서 왕십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필자에겐 늘 ‘왕십리 똥파리’란 별명이 따라다녔다.
새삼스레 소중한 지면을 개인사와 회한으로 낭비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왕십리, 정확히 이야기하면, ‘왕십리로 222’ 이것이 현재 한양대학교의 주소이고 한양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들의 학교와 직장 주소임을 상기시키고 싶어서이다.
일본의 사상가 나카무라 유지로(中村雄二郞)는 ‘장소’, ‘장(field)’, ‘토포스(topos)’는 단순히 추상적인 공간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곳도 아니며. 다양한 존재론적 질문이 응축된 장이자 생명과학을 비롯한 현대 자연과학의 최첨단의 문제, 더 나아가 수사학적, 언어적 장소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또한 진정한 자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만이 아니라 자각이 이루어지는 장소 자체에 대한 자각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도 했다. 개천에선 용이 날 수 있지만, 척박한 사막에서 풍성한 벼를 수확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클리셰가 잔뜩 묻어 버린 “몸과 땅이 둘이 아니다(신토불이, 身土不二)”라는 말은 숙고할 만한 존재론적 언명이다.
1939년 7월 중일전쟁이 본격화돼 어수선하던 일제강점기 종로구에 세워졌던 동아공과학원은 한국 전쟁 시기엔 부산 완월동 가교사로 옮겼다가 전쟁이 끝난 1953년 중구 신당동 임시 교사를 거쳐 지금의 왕십리로 222에 자리 잡은 지 70년이 됐다. 지난 84년간 약 35만 명의 청년들이 꿈을 심고 힘을 길렀던 한양대학교란 장소는 내게 어떤 토포스일까? 이곳은 취직 공부를 하는 곳일까 아니면 인생을, 학문을, 정의의 꿈을 꾸고 힘을 기르는 곳일까? 나는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곳을 보다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무엇보다 이곳은 나의 성장과 연결돼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곳을 우리의 성장을 이루어 내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
이쯤에서 눈치 빠른 독자는 필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챘을 것이다. 법정 스님은 홀로 우뚝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에라스뮈스의 격언집엔 자기 동네 로도스섬에서 뛰었을 땐 엄청나게 높이 뛰었다고 자랑하는 청년에게 한 청중이 일어나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Hic rgodos, hic salta)”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는 다시 학생들에게 전한다.
“여기가 왕십리다. 여기서 뛰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