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신문 면접을 보던 중. 면접관이 물었다, “공대생인데, 학과 공부가 힘들텐데 신문사 생활까지 할 수 있겠어요?” 필자는 대답했다, “글 쓰는 건 제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 인생의 활력소가 되지, 저를 피곤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필자는 합격 소식과 함께 부푼 마음을 갖고 신문사에 들어갔다. 영화, 드라마에서나 보던 폼 나는 기자의 일상이 펼쳐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생활이 필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원하는 부서에 들어가지 못해 관심없는 주제를 취재해야 했다. 부끄럽지만 거리에 나가 인터뷰를 요청하고, 일주일 내내 취재를 하러 뛰어다니며 밤을 새워 기사를 완성했다. 데스크진에 의해 필자가 원하는 대로 기사를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문사의 기자인가, 아님 노예인가?’하는 생각 들었다. 힘들어도 보람은 있을 줄 알았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미래에 기자가 될 것도 아닌데 신문사 일을 계속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학점 관리 잘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필자였기 때문이다. 대학보도부 정기자가 되고 신문사에 쏟는 시간이 더 많아진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다음 학기에는 꼭 나갈 거야”라고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다음 학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신문사를 나가고 싶지 않다.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한대신문 임기인 3학기를 채우겠단 오기 때문인지, 신문사의 좋은 사람들 때문인지, 장학금과 원고료 때문인지, 다른 기자들에게 피해를 줄 게 걱정돼서 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마치 신문사를 나가지 못하게 막는 보이지 않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만 같다.
한대신문이 발행되는 월요일, 다른 과 선배들이 내 기사를 사진으로 찍어 “잘 읽었어”라는 응원의 말과 함께 카톡으로 보내주곤 한다.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수록 점점 필자가 신문사에 쏟았던 노력과 그로 인한 고단함들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깨닫는다. 처음엔 그저 주변의 일반적 공대 친구들은 한대신문의 존재조차 모르니까, 신문을 어떻게 쓰든 공대생인 필자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신문사에서 하는 고생들이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한대신문이 누군가에게는 한 주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을. 따라서 앞서 느꼈던 이 알 수 없는 마음에 대해 ‘기자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나름의 보람과 의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답을 내리고 싶다.
이제는 “다음 학기 때 진짜 나가야돼”라며 필자를 위한 말을 해주는 친구들에게 신문사 일이 생각보다 할 만한 이유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는 필자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분명 한대신문에 대한 아무런 애정도, 사명감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필자가 쓴 기사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날아갈 듯이 기쁘고, 아쉬운 평가를 받으면 다음엔 기필코 잘해내겠다는 오기가 생긴다. 지금, 필자는 “신문사를 아끼고, 한대신문 대학보도부 기자임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아직 다음 학기에 필자가 신문사에 남아 있을지 없을지 확언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판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감정에 충실했을 때, 필자는 한대신문에 계속 남고 싶다.
[취재일기] 한대신문, 계속 하고 싶은 이유
- 한대신문
- 승인 2017.11.13
- 호수 1467
- 6면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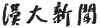
더 좋은 기사로 다음학기까지 건승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