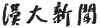일요일 오후, 월요일에 대한 부담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할 시간. TV를 켜면 재야(在野)의 강호들이 노래 실력을 겨루는 오디션 현장이 펼쳐진다. 내로라하는 제작자들이 색깔 있는 기준으로 참가자들의 가능성을 심사하고 결국 자신의 회사로 영입해 데뷔시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구조다. 몇 해에 걸쳐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면서 한 때는 참가자들의 실력과 심사위원들의 말솜씨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요즘은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디션, 어쩌면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의 한 단면이 예능으로 미화되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TV 오디션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다. 심지어 앨범이 있는 기성가수들도 종종 뛰어들기도 한다. 그들은 메이저 기획사 대표들 앞에서 노래 한 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감상을 누릴 시간은 아주 짧다. 실력을 보여줄 기회도 많지 않다. 몸상태? 그런 것을 고려해달라는 것은 사치다. 나름 ‘노래 좀 한다’고 인정받아온 그들이지만 얼굴에 쏟아지는 평가는 때론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한국에서 가수로 성공하려면...’이란 실체 모를 전제 아래 참가자들의 재능이나 실력은 낱낱이 발가벗겨진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이 노래하며 살기 위한 많은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일텐데, 어떤 이에게는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단지 주류(主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다.
재미있는 것은 벌써 4년 차에 접어든 이 프로그램 출신 중 반짝 화제가 된 인물은 있었지만, 이렇다 할 영향력 있는 가수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되고, 검증되고 또 검증된 실력자라 할지라도 대중의 선택이란 또 다른 것이다. 문득 90년대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태지 씨가 참여했다면 어땠을지 그려본다. 그는 과연 지역 예선이나 통과할 수 있었을까?
뽑는 사람은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하고 지원하는 사람은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이상한 구조의 세상이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함께’를 꿈꾸는 몽환적 동거의 그림. 꼭 맞는 인재를 뽑겠다며 그렇게 신중을 기했는데 대졸신입사원 4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회사를 떠나는 딜레마의 사회. 그들은 서로 무엇을 기대했으며, 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었을까?
주말 예능을 보다 잠긴 엉뚱한 생각 끝에 창 밖 너머 교정의 학생들이 눈에 들어온다.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일까, 그리고 학교는 그런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내셔널지오그래픽스의 카메라에 잡힌 사바나의 사자가 아니라, 영화 라이언킹 속의 사자, ‘심바’의 모습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피의 경쟁으로 얼룩진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공존과 상생을 꿈꾸는 인간적 삶이라면 말이다.
[진사로]오디션의 사회,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라
- 임상훈<교수학습 개발센터> 전문연구원
- 승인 2015.04.04
- 호수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