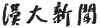19세기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얼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통섭(統攝, consilience)이란 개념은 ‘더불어 넘나듦(jumping together)’이란 말로 짧게 요약된다. 즉 통섭이란 서로 다른 현상들로부터 도출되는 귀납들이 서로 일치하거나 정연한 일관성을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에드워드 윌슨은 ‘지식의 대통합’이란 관점에서 지나친 과학적 방법론 때문에 사물이 미분화, 파편화되어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맥락(context)밖에서 고유한 존재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서구 과학지상주의를 르네상스적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통섭을 설명한 바 있다.
가히 빛의 속도로 축적되는 실증적 연구결과물들은 수용자인 의사(疑似) 귀납주의자인 의사(醫師)를 옥죄고 있다. 주위를 둘러 볼 여유로움을 포기한 채 앞만 보면서 질병과 환자를 돌보는 카르마를 받아들여야 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임상의사의 갈 길이란 플라톤의 동굴 속 그림자만 보고 사는 죄인처럼 깊은 밤 장대비를 헤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운전사의 좁디좁은 시야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의사가 본분을 벗어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논한다는 것은 분명 가소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정해진 장르 안에서 퓨전과 크로스오버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하는 문화의 질긴 생명력은 20세기 초 모더니즘 사조에 반등하여 해체와 구성을 반복하면서 구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성으로 입증된 바 있다.
박웅현 선생의 강의로 유명해진, 대학 정심장(大學 正心章) 편에 있는 ‘심부재이 시이불견 청이불문 식이부지기미(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란 글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의 ‘보이지 않는 고릴라’처럼 숙명적으로 세상을 자기방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정보를 취득하는 최초의 선택이 인간을 얼마나 비합리적인 대상으로 만드는지 설명한다. 그동안의 매몰비용을 감내할지 말지에 따라 회색지대를 부정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평가하려다 종국에는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결과를 부정하고 자기최면에 빠져버리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로 침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초의 전제가 틀리면 파생되는 결론의 도출 역시 옳을 수 없는 법이다.
통섭의 전제조건인 소통은 시청(視聽)을 견문(見聞)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투영되는 현상(現象)학적 사실(寫實)들은 회자되는 담론 이면의 사실(事實)이라는 초현실적 오브제로 형상화한다. 쥐뿔이라도 알아야 상대방에게 맞장구도 쳐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류의사가 못되는 40대 후반의 의대 신경외과교수로서 할 수 있는 변명이란 결국 등 뒤의 횃불로만 내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현세를 아주 가끔씩은 벗어나서, 묶인 목을 뒤로 돌려 동굴밖 세상도 가끔 흘낏거리며 스스로의 블라인드 스팟을 줄여나가는, 돈 되지 않는 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게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가히 빛의 속도로 축적되는 실증적 연구결과물들은 수용자인 의사(疑似) 귀납주의자인 의사(醫師)를 옥죄고 있다. 주위를 둘러 볼 여유로움을 포기한 채 앞만 보면서 질병과 환자를 돌보는 카르마를 받아들여야 하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임상의사의 갈 길이란 플라톤의 동굴 속 그림자만 보고 사는 죄인처럼 깊은 밤 장대비를 헤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운전사의 좁디좁은 시야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의사가 본분을 벗어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논한다는 것은 분명 가소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정해진 장르 안에서 퓨전과 크로스오버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하는 문화의 질긴 생명력은 20세기 초 모더니즘 사조에 반등하여 해체와 구성을 반복하면서 구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성으로 입증된 바 있다.
박웅현 선생의 강의로 유명해진, 대학 정심장(大學 正心章) 편에 있는 ‘심부재이 시이불견 청이불문 식이부지기미(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란 글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의 ‘보이지 않는 고릴라’처럼 숙명적으로 세상을 자기방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정보를 취득하는 최초의 선택이 인간을 얼마나 비합리적인 대상으로 만드는지 설명한다. 그동안의 매몰비용을 감내할지 말지에 따라 회색지대를 부정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로만 평가하려다 종국에는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결과를 부정하고 자기최면에 빠져버리는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로 침잠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초의 전제가 틀리면 파생되는 결론의 도출 역시 옳을 수 없는 법이다.
통섭의 전제조건인 소통은 시청(視聽)을 견문(見聞)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사회 전반에 걸쳐 투영되는 현상(現象)학적 사실(寫實)들은 회자되는 담론 이면의 사실(事實)이라는 초현실적 오브제로 형상화한다. 쥐뿔이라도 알아야 상대방에게 맞장구도 쳐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일류의사가 못되는 40대 후반의 의대 신경외과교수로서 할 수 있는 변명이란 결국 등 뒤의 횃불로만 내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현세를 아주 가끔씩은 벗어나서, 묶인 목을 뒤로 돌려 동굴밖 세상도 가끔 흘낏거리며 스스로의 블라인드 스팟을 줄여나가는, 돈 되지 않는 일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게 생존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