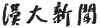집 근처에 들판이 있었다. 도심지에서는 드물게 꽤나 넓은 들판이었다. 누가 일부러 꾸민 것은 아니나 보기 좋게 관목 따위가 서 있었다. 떼도 적당히 덮여있어서 베고 누우면 포근한 것이 침대보다 나았다. 도심 중심지로 향하는 초입에 위치한 들판이라 뒷산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도심지로 불어가는 통로이기도 했다. 간혹 그 길을 따라 시내로 걸어 갈 때면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이 살포시 밀어주는 듯 하기도 했다.
들판이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그 평평함이었다. 그 넓은 들판이 돌멩이로 눌러놓은 듯 평평했다. 공을 차도 굴러가는 일이 없었고, 아이들이 뛰놀아도 다칠 염려가 없었다. 동네 영감들의 산책로이기도 했고, 사랑방이기도 했다. 어느 커플은 나란히 앉아 예쁘게 사랑을 말하기도 했다.
들판은 주인이 없었다. 검정색 세단에서 내린 이가 운전에 굳은 몸을 풀기도 했고, 폐박스를 산같이 쌓은 리어카를 끌던 노인네가 허리를 펴는 곳이기도 했다.
들판은 이름이 없었다. 동네에서만 평생을 살았다는 노인에게 ‘할배, 요 이름이 먼교?’라고 물어도 대답은 ‘내가 아나’였다. 주인이 없고, 이름이 없는 이 평평한 들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었다. 들판은 건강했다.
군에 있을 무렵, 들판에 요새 유행한다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선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역 후 다시 가본 들판엔 40층짜리 아파트가 서있었다.
‘스타시티’ 들판은 더 이상 평평하지 않았다. 하늘의 엉덩이라도 찌를 양인지, 삐죽 솟은 그 아파트는 위압적이었다. 아파트는 주인이 있었다. 지문인식을 통해 아파트는 주인만을 받아들였다.
도심지에 있던 명품점들이 모조리 옮겨왔다는 상가, 검정색 세단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폐박스를 실은 리어카는 볼 수 없었다. 커플들이 예쁘게 사랑을 말하던 곳에는 이제 나가요 언니들이 그리 많이 산단다. 고급 상가가 생기자 주변에 룸살롱이 늘었다던가. ‘스타시티’라는 이름이 붙어버린 들판은 명품구입과는 일이 없는 이들과는 무관한 곳이 되었고, 그곳 주민만의 것이 되었다. 그곳은 이제 평평하지 않다. 들판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았다.
그 금싸라기 땅이 아까워서인지, 사람들은 그곳에 투자를 했고 돈을 벌었다. 이름도 붙여줬다. ‘별들의 도시(스타시티)’. 지난 추석, 근 몇 년 만에 별들의 도시가 된 들판을 찾았다. 아파트는 매매가 안 돼 상한 이처럼 곳곳에 불이 꺼져있었고, 상가엔 간판처럼 임대 광고가 붙어있었다. 도시는 탄생 직후의 빛을 잃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높았고 들의 흔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불 꺼진 별들의 도시를 지나 시내로 걸어가는 길에 등을 밀어주는 바람은 없었다. 평평함을 잃은 들판은 들판이 아니었고 바람은 그곳을 비껴 불었다.
아주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면, 아니 어린 친구들이라도 자신이 어렸을적 거닐던 고향 동네가 달라져 아쉬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 아버지의 복고는 세시봉이고, 우리들의 복고는 HOT다’라는 드라마의 도입부처럼 누구에게나 과거의 추억은 아련하다. 스마트 시대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조금은 불편했어도 편안했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들판이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그 평평함이었다. 그 넓은 들판이 돌멩이로 눌러놓은 듯 평평했다. 공을 차도 굴러가는 일이 없었고, 아이들이 뛰놀아도 다칠 염려가 없었다. 동네 영감들의 산책로이기도 했고, 사랑방이기도 했다. 어느 커플은 나란히 앉아 예쁘게 사랑을 말하기도 했다.
들판은 주인이 없었다. 검정색 세단에서 내린 이가 운전에 굳은 몸을 풀기도 했고, 폐박스를 산같이 쌓은 리어카를 끌던 노인네가 허리를 펴는 곳이기도 했다.
들판은 이름이 없었다. 동네에서만 평생을 살았다는 노인에게 ‘할배, 요 이름이 먼교?’라고 물어도 대답은 ‘내가 아나’였다. 주인이 없고, 이름이 없는 이 평평한 들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었다. 들판은 건강했다.
군에 있을 무렵, 들판에 요새 유행한다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선다는 얘기를 들었다. 전역 후 다시 가본 들판엔 40층짜리 아파트가 서있었다.
‘스타시티’ 들판은 더 이상 평평하지 않았다. 하늘의 엉덩이라도 찌를 양인지, 삐죽 솟은 그 아파트는 위압적이었다. 아파트는 주인이 있었다. 지문인식을 통해 아파트는 주인만을 받아들였다.
도심지에 있던 명품점들이 모조리 옮겨왔다는 상가, 검정색 세단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지만, 폐박스를 실은 리어카는 볼 수 없었다. 커플들이 예쁘게 사랑을 말하던 곳에는 이제 나가요 언니들이 그리 많이 산단다. 고급 상가가 생기자 주변에 룸살롱이 늘었다던가. ‘스타시티’라는 이름이 붙어버린 들판은 명품구입과는 일이 없는 이들과는 무관한 곳이 되었고, 그곳 주민만의 것이 되었다. 그곳은 이제 평평하지 않다. 들판은 더 이상 건강하지 않았다.
그 금싸라기 땅이 아까워서인지, 사람들은 그곳에 투자를 했고 돈을 벌었다. 이름도 붙여줬다. ‘별들의 도시(스타시티)’. 지난 추석, 근 몇 년 만에 별들의 도시가 된 들판을 찾았다. 아파트는 매매가 안 돼 상한 이처럼 곳곳에 불이 꺼져있었고, 상가엔 간판처럼 임대 광고가 붙어있었다. 도시는 탄생 직후의 빛을 잃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높았고 들의 흔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불 꺼진 별들의 도시를 지나 시내로 걸어가는 길에 등을 밀어주는 바람은 없었다. 평평함을 잃은 들판은 들판이 아니었고 바람은 그곳을 비껴 불었다.
아주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면, 아니 어린 친구들이라도 자신이 어렸을적 거닐던 고향 동네가 달라져 아쉬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복고’ 열풍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 아버지의 복고는 세시봉이고, 우리들의 복고는 HOT다’라는 드라마의 도입부처럼 누구에게나 과거의 추억은 아련하다. 스마트 시대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조금은 불편했어도 편안했던 시절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