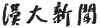저자 서현 교수 “건축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존재의 가치추구”

14세기 전만 해도 건축가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기능공이었다. 하지만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된 문예부흥의 물결은 건축에도 들이닥쳤다. 기존의 보호와 안락의 기능성을 중시하던 건축물은 조형요소마다 의미를 지니게 됐다. 그리고 건축가들은 인문학적 고찰을 시작했다. 건축이 인문학을 만나 ‘건축예술’로 재탄생한 것이다.
지난 27일 백남학술정보관에서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의 저자 서현<공대 건축학부> 교수의 특강이 열렸다. 특강은 건축물에 숨어있는 조형요소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서 교수는 말한다. “무심한 콘크리트는 캔버스가 되고 빛은 날카로운 붓이 돼 한 폭의 그림이 탄생합니다.”
그에게 한양대역 3번 출구의 계단, 그 틈새로 들어온 빛과 계단이 만나 생기는 그림자는 건축의 중요한 요소다. 의미 없이 튀어나온 돌쩌귀도 내리치는 태양을 만나 그림자의 음영을 드리우면 그것도 건축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서 교수는 강연 중 ‘해심헌’이란 건축물을 소개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의 부탁으로 그가 직접 설계한 저택이다. 이 저택은 그의 인문학적 창의력이 묻어난다. 저택의 외벽들은 모두 얇게 자른 현무암으로 이뤄졌다.
햇빛이 비치는 오전과 오후에는 얇은 현무암 외벽의 공극(현무암 재질 상 생기는 작은 구멍. 현무암을 얇게 잘라 올록볼록한 단면이 생성된다)을 통해 신비스러운 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저택 내부의 빛이 현무암의 공극을 넘어 외벽을 휘돌아나가는 물에 반사된다. 물에 반사되는 자그마한 공극들의 빛은 마치 물에 떠 있는 ‘한 잎의 벚’같은 모양을 취한다. 사계절 내내 해심헌의 밤은 봄에 휩싸인다.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실제로 물가 옆에 벚나무가 있었다. 서 교수는 “봄날의 밤이 되면 벚나무에서 떨어지는 벚잎과 빛이 만들어내는 벚잎이 어우러져 어느 것이 진짜 벚잎인지 구분할 수 없는 모양을 구상했다”고 한다.
“제 인생의 가치만큼 존재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해심헌을 가족들이 자주 얼굴을 보고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했죠. 가족이 부대끼며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획했습니다. 해심헌이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함을 느끼는 공간이 됐으면 했습니다.”
서 교수의 건축은 ‘존재의 가치’를 찾는 행위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이 건물이, 방이, 요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의 가치를 연구하는 인문학이 서 교수가 추구하는 건축의 핵심이다. 인문학적 의미를 고려하는 차원을 넘어 인문학적 상상력의 토대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실제로 서 교수는 설계할 때 어디에서 가장 영감을 받느냐는 질문에 소설이라 답했다. 자연과 조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축이 화두가 됐다. 확실히 건축은 인문학적 사고 아래 발전하고 있다. 현재 한옥이 재조명 받는 이유도 ‘사람냄새 나는 건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건축은 인문학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