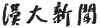학기말을 마치지 못하고 기어코 몸살이 도졌다. 거기다 장염까지 겹쳐 몸도 마음도 말이 아닌 상태다. 아직 젊다고 느꼈었는데 벌써 체력이 달리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
행사와 논문과 회의와 또 거들어야 하는 각종 안팎의 일들이 복잡하게 흐트러진 몸둥아리 안팎을 맴돌고 솟구치다 나동그라지기 시작하는 모양을 보면서, 나는 겨우 또 하나의 펑크를 막아보려 간신히 컴퓨터 키보드 앞에 앉았다.
한양대학보 원고 마감약속을 이미 하루 넘긴 오늘이지만 나는 이틀 전부터 멍하고 어지러운 머리로 무얼 쓸까 무얼 쓸까 밤새 뒤척거리곤 했다. 탈계몽의 시대에 다 먹고 난 자장면 덮개로나 겨우 쓰이는 학교 신문의 교수칼럼 페이지는 어줍잖은 ‘꼰대’의 잔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에, 자기당위적인 말을 대대거리며 반복하는 것 또한 허탈해보이기에, 나는 지난달 어느 바쁜 오후 이 원고를 지나가듯 덜컥 약속해버린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결국 어찌 못할 내 미련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올해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 더했을 뿐인가.
2009년의 한국을 살면서 내게 가장 충격적으로 날아와 꽂힌 비수 같은 단어는 ‘냉소주의’였다. 그 단어는 이런 문장 속에 배치돼 있었다. “이제는 우리의 뿌리 깊은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은 바로 그 문장 자체를 어느새 차가운 웃음으로 흘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냉소를, 그 시니컬하고 시큰둥함의 오싹한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건 또 뭔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인가. 한 해 내내 내 무의식속에 그 질문과 그때의 섬뜩한 느낌은 맴돌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결국 또 한 번 맡겨진 학교신문의 이 원고를 메우는 마당에 내가 생각해낸 화두는 ‘냉소’가 됐다. 차가운 미소, 그 시니컬한 웃음은 결코 극복하자고 외치는 계몽적 구호로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자명하다.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자는 외침은 애초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이야기다.
그것이 다시 계몽적 구호처럼 ‘선언’되고 팡파레 속에 ‘공표’될때 그것은 일종의 감정적 모순을 경험케 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차가운 웃음들을 다시 지은 것인지도 모른다.
냉소를 깨는 것은 냉소를 만드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다. 냉소의 형성 자체가 늑대가 온다고 외치는 소년의 이야기를 세 번씩 들었던 경험에서 오기 때문이다. 약속의 번복들, 혹은 대화결과의 무의미함을 발견한 결과 때문이다.
결국은 진짜 늑대가 와서 한 번 이상 물려야 한다.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뒤라야 그들이 다시 마주 앉거나 말거나 할 것이다. 그 뒤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정성이 담긴, 진솔한 감동(感動)뿐이다. 나는 단어 하나 하나의 무게에 뒤척이고 상념에 시달리던 한 시인에게서 그것을 만난다.
『창밖에서 산수유 꽃 피는 소리한 줄 쓴 다음 들린다고 할까 말까 망설이며 병술년 봄을 보냈다. 힐끗 들여다 본 아내는 허튼소리 말라는 눈치였다.
물난리에 온 나라 시달리고 한 달 가까이 열대야 지새며 기나긴 여름 보내고 어느새 가을이 깊어갈 무렵 겨우 한 줄 더 보탰다. 뒤뜰에서 후박나무 잎 지는 소리.』- 김광규, 「춘추」
이것이 올해가 가기 전 내가 입에 담게 될 의미 있는 마지막 몇 마디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