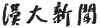가을 초엽의 햇살이 청명하다. 한마당에선 동아리들이 댄스음악을 틀며 시끌벅적 신입생들을 모집한다. 학기 초, 인기 있는 강의를 차지하려고 학생들은 무한클릭을 감행했을 터. 이는 내가 입학한 2004년부터 무한반복되던 일이다. 이제 대학의 유일한 공론장인 자유시판에는 연애, 대학의 네임밸류, 자질구레한 생활사 등등으로 매일 활기가 넘친다.
변함없는 대학의 개강 초 분위기를 접하는 심경은 복잡미묘하다. 2009년의 대학가는 이렇구나. 2010년대의 대학가는 (내가 직접 접해보진 못했지만) 80년대나 90년대처럼 굵직한 시대로 변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불과 10년 전쯤 우리가 오고가는 캠퍼스에서 전경이 학생들에게 맞아 사망했다는 일이, 이제는 마치 소설처럼 느껴진다. 몇 년 사이에 학생운동ㆍ정치·구호·엄숙함·‘투신’의 이미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를 뿐이다. 누가 옳고 그름을 평가하랴.
제안 하나, 그 실질적 정신을 잃고 아직도 어릿광대처럼 되풀이되는 ‘운동권’의 유산을 부지런하게 배격하자. 같은 건 진탕 마시는 것뿐이면서, 건배의 구호로 ‘단결’과 ‘투쟁’을 외치는 광경처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은 없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문장이 유행한 지도 십수년이 흘렀다. 요즘처럼 대학생으로서의 나의 행복을 구김살 없이 추구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대학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비유컨대 혁명은 즐겁게 웃으면서도 가능한 것일까. 어려운 문제겠지만, 나는 이 질문에 꽤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개인의 자연스러운 욕망의 문제에서 멀어진 혁명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덮어놓고 사회정의를 외치는 시대를 떠나보냈다면, 이제 대학생 개개인을 둘러싼 문제들를 들여다보자. 그동안 지나쳐왔던 소소한 일상사들에 주목해보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지극히 작은 문제라도 상관없고, 모임의 이름이 거창할 필요도 없지만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을 밀어주자. “쟤는 뭔데 저렇게 나서”라는 만연한, 그리고 조금은 비겁한 분위기를 바꿔나가자. 그것은 인기 없는 책 한 권을 함께 읽는 일일수도 있고, 교양테니스 수강인원 좀 늘리라는 깜찍한 서명운동이 될 수도 있다. 「가난뱅이의 역습」이란 책의 전략을 이용해 훗날 ‘한양대학의 궁상스러움을 지키는 모임’ 같은 것을 만드는 후배가 나타난다면, 나는 모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간직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언가를 함께 한다는 것의 신선한 즐거움을, 후배들이 ‘2010년대의 감각’으로 새롭게 키워나가기를 바란다. 그런 경험도 없이 취업 스터디니 토익 스터디 니 운운할 때는, 이미 말짱 꽝이다.
박성열<사회학과 04> 동문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