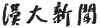병원에는 정상인보다는 환자나 아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말고도 사람을 심란하게 감염시키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면, 매일 병원에 출근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역치가 없으면 견디기 어렵다.
더구나 아침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중환자실이요 밤에 제일 늦게까지 있는 곳이 수술실이 돼버리면 죽음에 무감각해질 법도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항체는 만들어지지 않은 모양이다.
출혈로 시뻘겋게 된 뇌를 현미경으로 보면서 헤집다보면 그 조그만 부분마다 감춰져있던 기억의 편린이 오롯이 내 머리로 이입되기도 한다.
죽음이나 자살이란 단어가 트렌드화된 요즘, 인터넷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싸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 인재에 의한 대형 참사, 그리고 전직대통령의 자살과 팝 황제의 죽음. 이러한 현상의 기저병리가 어떻든 죽음은 엄연한 실체적 사실이다.
비가역적인 자연으로의 회귀 혹은 잊혀짐의 연대기란 점에서 경외이자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사람의 이름과 목소리는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항상 타인에 의해 호명되고 울림판을 통해 공명된 음파로만 체감되는 지극히 수동적인 운명체다. 체취나 버릇 또한 그러하다.
후각과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는 정서적 내재화와도 맞물려 있어 습관화된 피사체 덩어리로서의 사람을 반추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사는 과정 못지않게 죽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기억을 남길지도 중요하리라.
최근 김 할머니의 존엄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삶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뇌의 기능이 소실되어 의식도 없이 호흡하고 심장만 뛰는 식물상태의 삶도 있고, 인지하고 대화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움직이는 인간적인 삶도 있다.
먹고 살기 팍팍해진 근래에는 고령의 위중한 환자들에서 애초에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늘고 있다.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거라면 아예 미련을 갖지 않겠다는 아들과 딸의 심정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암이나,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이전의 그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서서히 침몰하는 환자를 하릴없이 지켜보는 가족의 속모를 고통 또한 그러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급성이건 만성이건 간에 이미 그 시점에 오면 사라지게 된다.
존엄사의 당위성이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지에 대해 말하려 한다. 내 앞으로 배당된 시계의 건전지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또 고장없이 잘 작동할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열심히 그러면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다가 오래 끌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지.
그렇다면 내 영정 앞에서 진심으로 울어 줄 사람이 몇 명은 될 거고 시간이 지나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다. 내 보잘것없는 이름과 목소리가 거북하지 않은 내 체취와 이따금 미소를 짓게 만드는 내 습관들에 의해 단단히 포장되어 좋은 여운을 남기게 되면 좋으련만.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사실과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지만 죽음의 시간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면 매일아침이 고맙고 가슴이 벅찰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 살아지는 게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겠지. 언제 올지 모를 죽음의 시간에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지, 남겨질 이름에 대해 살짝 고민해보면
어떨지.
이형중<의대ㆍ의학과> 교수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