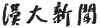퀴즈를 하나 내보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샤를르 드골 에뚜왈, 스탈린그라드, 당똥, 빅또르 위고, 꼴로넬 파비엔, 프레지던트 케네디, 샤를르 미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 역 이름이다. 짐작하듯 파리 지하철 역 이름 상당수에는 사람 이름이 붙어있다. 지하철역이 위치한 거리 이름 또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다. 파리의 지하철 역 이름들은 각 공간의 장소성과 역사성에 깊숙하게 연결돼있다.
예를 들면 샤를르 드골 에뚜왈은 샤를르 드골이 2차 세계대전 중 점령당했던 파리로 복귀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인 개선문에 있다. 그리고 드골은 퍼레이드 장소를 고를 때 역사의 무게와 상징성의 힘을 활용했다. 그곳은 나폴레옹의 개선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개선문 한 가운데 아래쪽에는 “이름 없는 용사들의 무덤”이 놓여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켜져 있다. 그렇게 그 장소는 국가 정체성, 신성성과 역사성이 집합되어 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스탈린그라드역이 있는 곳은 프랑스의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적 중심지다. 파리 코뮌 사건이 벌어진 중심 무대기도 하다. 공장 터가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노동자의 후예들과 외국인 출신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산다. 오랫동안 파리 시장을 지냈던 우파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그의 재임기간 동안 한 번도 이곳의 이름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회당 당수였던 미테랑 대통령이 자신의 치 떨리는 정적이었던 샤를르 드골의 이름을 거리와 공항 이름에서 한 번도 지우려고 한 적이 없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 실체임을 인정했다. 사람들의 기억 안에 공유된 공동의 재산이 된 것이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연속선상 위의 존재일 뿐이므로. 모든 파리의 시민들은 그런 기억들이 공유되는 자신들의 도시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다. 파리는 한국서도 가장 잘 팔리는 브랜드 중 하나 아닌가?
얼마 전 한양 7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럼을 보았다. 그냥 70이라는 숫자가 장식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었다. 깔끔하다. 그런데 은유와 상징이 잡히지 않는 1차원적 직설법이다. 색깔도 파란색이다가 노랗고 붉은 색이다가 한다. 나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멋지고 장황한 수업 발표를 한 직후에 종종 묻곤 한다. So what? 그래서, 그 의미가 뭔데? 문화상징의 알맹이가 빠져있으면 화려해 뵈던 엔진은 그저 흔하고 촌스런 단순 메커니즘으로 전락한다.
어떤 대학에서 과학기술 전공 관련 건물을 새로 지으며 야심적으로 이름을 공모한 적이 있다. 어떤 이는 ‘장영실관’이란 이름을 제출했었다 한다. 이 땅에 살았던 실제 인물의 생생한 기억과 정신사를 후예들에게 잇도록 하고자. 하지만 논란 끝에 결국 건물 이름은 그저 흔해빠진 ‘과학기술관’이 되어버렸다. 법대 건물은 ‘법학관’. 공대건물은 ‘공학관’... 어떤 대학의 건물들 이름은 그냥 아라비아 숫자를 붙여 ‘1동, 2동, 3동....’으로 나가기도 한다. 세워진지 오래된 명문대학들에서 기억의 공간들, 상징들,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는 어떻게 기념되며 가꿔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스스로 신화를 만들고자 안간힘하며 정성스레 다듬고 꾸미는 사회가 있고 스스로의 역사를 무시하며 기계적으로 무감각하게 움직이는 사회도 있다. 자신의 역사와 상징을 고민하며 가꾸지 않는 사회는 당장 그 주민들부터 마음 붙일 곳을 잃을 것이며, 그리고 바깥세상을 향해 내보낼 미래 정체성의 근거도 없을 것이다. 그대 부디 이를 기억할진저.
송도영<국문대ㆍ문화인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