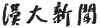김계성<의대ㆍ의학과>교수
너무 어려운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 자신이 과학자라고 생각하며 살아 온지도 20년이 되었고 전업 과학자가 된지도 10년이 넘었다. 능력 있는 과학기술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양대 학생들에게 어떤 길이 우리가 가야할 길인지에 대한 작은 정보라도 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쓴다. 민중국어사전에 보면 ‘과학’이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 넓은 뜻으로는 학(學)과 같은 뜻이고, 좁은 뜻으로는 자연 과학을 일컬음’이라고 설명돼있다.
과학자인 내가 보아도 그 뜻이 금방 와 닿지는 않는 어려운 얘기다. 이 뜻대로라면 ‘과학자’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해 체계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자’이다. 요즘은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인지 또는 이를 위해 체계적인 벽돌쌓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 과학은 이런 것과는 조금은 동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현재 과학기술계를 보고 과학 (science)은 없고 기술 (technology)만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기초과학은 없고 응용만 있다고도 한다. 모두가 체계적인 탑 쌓기를 등한 시 하는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비꼬는 얘기일 것이다. 최근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하나가 되게 했던 올림픽 경기와 관련해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다. 하나는 메달 획득 성공이나 실패에 관계없이 당당한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고 둘은 한국에 활을 잘 쏘고 핸드볼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기에, 즉 실제적인 저변은 얼마나 깊고 훌륭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다.
요즘 동료 교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때와는 다른 행동양식을 학생들에게서 많이 느낀다는 것을 공감한다. 전통적으로 존중되던 권위, 겸손 등의 우리의 미덕이 현재에 와서 특히 새로운 세대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변화해 개성, 자신감 등으로 표출되는 것이 더 이상 나 자신을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어쩌면 나 자신도 당돌한 요즘 교수일지도 모르니 어쩌면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모두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금메달을 따고도 시종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겸손을 잃지 않는 젊은이. 우리가 바라는 이 시대의 과학 일꾼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다.
2년 전에 일본에 주재하는 Nature지 과학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가 물은 것이 한국의 줄기세포생물학 분야의 경쟁력 수준을 미국, 일본 등 과학 선진국과 비교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야구를 예로 들어 간접적인 답을 줬다. 일본은 고등학교 야구팀의 수가 수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십이다. 대회에서 단발 적으로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들 보다 우위에 있는 원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 한정된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생물학 분야 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한국 과학계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 과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마케팅에 의해 생산된 스타과학자가 아니라 써도 닳지 않는 무궁무진한 샘 같은 젊은 과학 인력이다. 그들은 갈고 닦은 실력과 개방적ㆍ진취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한양의 학생들 이라면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믿는데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옳은 길임을 잘 알고 있을 그대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