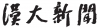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너 완전 MZ세대 같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거나, 새로운 트렌드를 알고 있을 때 필자와 필자의 친구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MZ세대는 1980년부터 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Z세대를 의미한다. 필자와 필자의 친구는 모두 MZ세대인 셈이다. MZ세대가, 같은 MZ세대에게 ‘MZ세대 같다’라니. 분명 어폐가 있다. 그럼에도 그런 말이 농담처럼 오간다는 건 당사자가 생각하는 MZ세대와 외부에서 정의 내린 MZ세대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언론에서 말하는 MZ세대 특징은 이렇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재미와 새로움을 쫓는다. ‘애사심이 없다’, ‘개인주의적이다’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기도 한다. 새로운 종(種)처럼 여겨지며 여기저기서 남발되는 MZ세대 담론에, 당사자로서 괜한 반발심이 생기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MZ세대 안에는 2005년생인 18세부터 1980년생인 43세까지 포함된다.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신입사원, 심지어 회사 내 팀장까지 모두 같은 세대인 셈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MZ세대(1980~2005년생)는 전체 인구의 34.7%나 차지한다. 과연 이 많은 이를 하나의 세대로 묶는 게 가능할까. 물론 세대를 나누고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베이비붐 세대나 X세대, 88만 원 세대처럼 말이다. 이렇게 청년들이 한 세대로 묶였을 때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단 장점도 분명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대론 안에서 다양한 청년의 삶이 단편화된단 것이다.
디지털에 익숙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들을 같은 세대로 규정하고, 분석하고, 일반화하는 건 무심하다 못해 게으르다. 하지만 이번 20대 대선은 그 게으른 방식으로 청년 정책을 논했다. 후보들은 여·야할 것 없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MZ세대를 소환했다. ‘MㅏZㅏ요 토크’, ‘민지(MZ)야 부탁해’와 식으로 말이다. MZ세대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니 메타버스,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선거 운동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은 눈에 띄지 않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MZ 세대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고려되지 않고, ‘MZ세대를 위한 공약’으로 뭉뚱그려졌다.
대선 레이스가 끝난 현재, 공약을 재검토해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대선 때와 같이 청년 세대를 향한 무심한 일반화가 아닌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 세대론을 연구한 독일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은 ‘같은 세대 안에서도 다른 세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세대가 동질적이지 않단 말이다.
MZ세대가 공감하지 못하는 MZ세대론처럼, 우리 사회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세대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정치가 세대론에 매몰되면 그 속에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 세대를 떠나 개인에 집중하는 세분화된 국정과제가 필요하다. 청년들의 다음 5년을 책임질 정부가 부디 ‘세대’가 아닌 ‘청년’을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