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문화테마 '사진'
천 마디 말보다 더욱 영향력 있는 한 장의 이미지는 우리의 일상에 희망찬 열기를 불러오면서도, 시대적 묘미를 사색하게 해준다.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우리에게 담아주는 사진들. 금주의 문화테마는 ‘사진’이다. 사진을 감상하며 시대를,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셔터를 눌렀다", 전시회 「퓰리처상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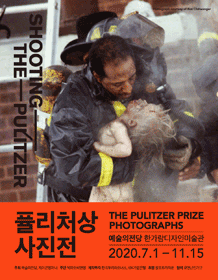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라고도 불린 ‘조지프 퓰리처’는 본인의 기부금을 △공공봉사 △공공윤리 △교육 진흥을 장려하는 상을 만드는 데 사용해달라고 유언했다. 이렇게 탄생한 ‘퓰리처상’은 1917년부터 오늘에까지 시대의 흐름을 포착한다. 국내에선 6년 만에 다시 열린 전시회 「퓰리처상 사진전」은 기자 안야 니드링하우스의 수상소감으로 제목과 같이 시작한다.
전시회 속 사진에 담긴 피사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하고 강하게 다가온다. 같은 시간에 놓여 있지 않아 그들을 헤아릴 수 없으면서도, 사진에 표현된 무수히 많은 사연과 사진 속 이들이 처한 상황은 보는 이마저 현장에 몰입시킨다. 전시된 사진 속에선 아름다움보다 피로 기록되는 역사가 많다. 사진 「수단 아이를 기다리는 게임」에선 아프리카 수단에 도착한 사진작가 케빈 카터가 유엔 식품 보급소로 가던 길에 굶주림에 쓰러진 사진 속 아이, 그리고 뒤에서 아이의 죽음을 기다리던 독수리를 촬영했다. 이처럼 전시회 사진 대부분은 상황을 고발하거나 설명하여 변화를 요구한다. 이를 감상하다보면 아름다움으로 왜곡된 현실 이면에 △가난 △기근 △전쟁의 잔상이 아련하게 남는다.
“사진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말할 수 있다면, 포토 저널리즘은 여전히 빛을 지닙니다”. 지난해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 김경훈의 말처럼 전시회 기간 동안 포토 저널리즘으로 시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피사체 너머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 책 「박상익의 포토 인문학」

모름지기 예술은 개인의 삶에서 출발한다. 서양사학자이자 아마추어 사진가인 저자 박상익은 약 20년 동안 일상에서 포착한 수많은 장면 중 52장을 골라 ‘사진과 인문학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했다. 이 책은 △문학 △사회 △역사 △정치 △철학 등의 분야에서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사진에 담긴 내용을 인문학과 접목시켜 우리 삶 전반을 돌아보게 한다. 이렇듯 이 책은 사진 한 장 한 장에 숨결을 불어 넣고, 마침내 인문학적 성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그려낸다.
사진은 삶을 사유하는 매개체로써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주위에서 만난 익숙한 것들을 사진에 담아 나만의 시선으로 매만지다 보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어느덧 자신만의 특별한 가치로 자리매김한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횡단보도의 ‘줄무늬’를 카메라에 담는다. 나아가 이를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정교한 줄무늬’에 빗대어 말한다.
순간은 지나가면 잊히지만, 그 순간을 잡은 사진은 영원하다. 그렇기에 사진 안에 나만이 알 수 있는 찰나를 담다 보면, 평범한 일상이 순간의 기억에서 영원의 추억으로 남게 된다. 작은 카메라를 들고 혼자 걸으며 ‘일상’에서 포착하는 소소한 이미지에서 ‘삶’을 길어 올리고 싶었다는 그.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임윤지 수습기자 yjlim0624@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