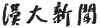10월 연휴가 끝나갈 무렵 나는 아산 병원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었다. 이날 문상 볼 일은 동생에게 있었고, 우리는 다른 일정 때문에 조문 시간을 길게 잡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나는 장례식장의 주차장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빨리 떠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쉽게 출발할 수 있는 장소에만 관심을 뒀다.
나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장소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장례식장 주변은 예전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 나와 같은 불량스러운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주변을 살펴보니 근거리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급히 차량을 이동했으나 정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병원을 한 바퀴를 돌았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덕분에 나와 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은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 짧은 시간에 여러 생각이 몰려왔다. 나의 위법 행위도 부끄러웠고, 이렇게 감시당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조지 오웰이 예견한 미래사회의 모습이 실감난 것이다.
사회 곳곳에는 감시자 빅 브라더가 알게 모르게 널리 분포돼 있다.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어두컴컴한 골목길에는 CCTV가 작동되고 있다. 때로 어떤 이들은 신고할 상황들이 생기면 휴대폰으로 신속하게 포착해 유튜브에 올린다. 그러고 보니 내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도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 조지 오웰이 예견한 감시망은 현재, 우리에게 양날의 칼처럼 작용한다. 나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우선이지만, 동시에 나를 감시, 구속하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져있고, 그 체제 또한 견고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러한 메커니즘에 익숙하여 감시 체제에 놓여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된다는 점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속에서 시민들은 빅 브라더가 조정하는 텔레스크린에 의해 일상을 감시당한다. 주인공 윈스턴 스미드는 순수한 사랑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감시 체제 때문에 애인과 헤어지게 된다. 결국, 자신을 감시하는 거대조직 빅 브라더에 굴복하는 인물로 작품은 끝난다.
한 세대가 흐른 후,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을 발표했다. 미셸 푸코는 이 책에서 표면적으로는 감옥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감옥과 감시의 체제를 밝히면서 권력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 있었을 것이다. 즉 권력이 인간과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처벌하고 감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근대적 인간의 삶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삶은 이들이 예견했던 것보다 더 치밀한 상태에서 감시당하는 것 같다. 권력의 주체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구조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의 카드 내역만 보면 나의 하루 일상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카드 내역을 통해 나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금융 거래나 구매를 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시스템 속에 있다. 그 어떤 형태로든 개인의 삶의 흔적은 기록으로 남는다. 이러한 때 오롯이 남는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윈스턴 스미드처럼 빅 브라더에게 굴복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과거에 대한 향수로 살아갈 수도 없다. 급변하는 사회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