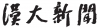학생들이 말할 수도 볼 수도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학생 대표자들과 학교
관계자들은 망언을 일삼으며 정당한 비판을 가하는 학생들을 기만하고 있다. 도대체 이 학교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비상구가 있기는 한 것인지
위기감이 엄습한다.
지난 14일 한 학생이 서울 총학생회 산하 해외교류위원회의 해외 명문대학 탐방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해교위 소속으로 추측되는 한 학생이 작성자에게 “한총련”이라고 매도하는 답변을 하며 논란이 가열됐다.
이에 대해 5월 22일자 서울신문은 “한양대 총학생회의 해외 명문대학 탐방 행사가 ‘외유’ 논란에 휩싸였다”며 “총학만의 특권의식 자체가 도덕성 차원의 문제인데 비운동권과 운동권 사이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결여를 드러낸 결과”라며 해교위 사태를 보도했다.
곧바로 서울 총학 허설 정책국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사를 작성한 모 기자는 ‘한총련’에 나름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글을 통해 비판을 흩트렸다. 기자의 인적사항을 뒷조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차치하고 한총련 출신 기자가 쓴 기사는 제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언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현실에 대한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비판의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판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허 국장의 대응은 해교위를 비판하면 모두 한총련이라는 식의 답변을 한 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을 비판하는 학생과 언론은 모두 한총련으로 몰아갈 셈인지 의문이다. 언론의 비판에 대해 뒷조사나 하는 이가 정책국장에 자리하고 있는 현 총학의 인사정책이 우려된다.
이와 비슷한 태도는 직원들에게도 발견된다. 해교위 사태와 관련 취재차 학생처에 들린 본보 수습기자는 관계자로부터 “기자라면 모두 죽여 버리고 싶다”라는 폭언을 들었다. 우리학교의 자정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기자에게 이해와 협조보다 폭언을 일삼아 내쫓은 직원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시각 한대신문은 폭언을 일삼은 학생처 관계자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이번 해교위 사태는 우리학교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학생들의 비판을 근거도 없이 ‘한총련’이라고 일소에 부친 행태, 언론의 비판을 뒷조사를 통해 ‘한총련’이라고 부각시킨 현 총학,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대응보다 폭력을 일삼은 학교 관계자들을 볼 때 우리학교에 소통은 없다고 단언한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향한 비판에 대해 ‘무대응’과 ‘한총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게시판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를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 관계자들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흥미로운 것은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해외명문대학 탐방 프로그램은 해외교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학생 선발권은 학생처에 있으며, 해외교류위원회는 서울 총학생회 산하라는 것이다. 내신·수능·논술이 수험생을 내리누르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었다면, 우리학교는 총학-해교위-학생처로 이어지는 완벽한 트라이앵글이 학생들을 내리누르고 있다.
지난 14일 한 학생이 서울 총학생회 산하 해외교류위원회의 해외 명문대학 탐방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해교위 소속으로 추측되는 한 학생이 작성자에게 “한총련”이라고 매도하는 답변을 하며 논란이 가열됐다.
이에 대해 5월 22일자 서울신문은 “한양대 총학생회의 해외 명문대학 탐방 행사가 ‘외유’ 논란에 휩싸였다”며 “총학만의 특권의식 자체가 도덕성 차원의 문제인데 비운동권과 운동권 사이의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결여를 드러낸 결과”라며 해교위 사태를 보도했다.
곧바로 서울 총학 허설 정책국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사를 작성한 모 기자는 ‘한총련’에 나름 깊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글을 통해 비판을 흩트렸다. 기자의 인적사항을 뒷조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차치하고 한총련 출신 기자가 쓴 기사는 제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언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현실에 대한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비판의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판을 통해 문제점을 수정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나 허 국장의 대응은 해교위를 비판하면 모두 한총련이라는 식의 답변을 한 학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을 비판하는 학생과 언론은 모두 한총련으로 몰아갈 셈인지 의문이다. 언론의 비판에 대해 뒷조사나 하는 이가 정책국장에 자리하고 있는 현 총학의 인사정책이 우려된다.
이와 비슷한 태도는 직원들에게도 발견된다. 해교위 사태와 관련 취재차 학생처에 들린 본보 수습기자는 관계자로부터 “기자라면 모두 죽여 버리고 싶다”라는 폭언을 들었다. 우리학교의 자정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기자에게 이해와 협조보다 폭언을 일삼아 내쫓은 직원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시각 한대신문은 폭언을 일삼은 학생처 관계자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이번 해교위 사태는 우리학교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학생들의 비판을 근거도 없이 ‘한총련’이라고 일소에 부친 행태, 언론의 비판을 뒷조사를 통해 ‘한총련’이라고 부각시킨 현 총학,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대응보다 폭력을 일삼은 학교 관계자들을 볼 때 우리학교에 소통은 없다고 단언한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향한 비판에 대해 ‘무대응’과 ‘한총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게시판을 통해 이번 사태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를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 관계자들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흥미로운 것은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해외명문대학 탐방 프로그램은 해외교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학생 선발권은 학생처에 있으며, 해외교류위원회는 서울 총학생회 산하라는 것이다. 내신·수능·논술이 수험생을 내리누르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었다면, 우리학교는 총학-해교위-학생처로 이어지는 완벽한 트라이앵글이 학생들을 내리누르고 있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