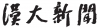논설위원│이 도 흠 <인문대·국문> 교수
5월은 말 그대로 계절의 여왕이다. 신록이 온 누리를 수놓으며 보는 이들마저
신선하고 건강한 마음이 들게 하고, 신록 사이 온갖 꽃들이 흐드러지며 아름다움에 대해 새삼 찬미하게 한다. 하늘은 투명하게 푸르러 그처럼 맑은
마음이나 다다를 수 없는 저 편의 진리를 추구하게 하고, 살결을 간질이며 맞춤한 온도로 스치는 미풍은 운동이든 공부든 몸을 놀려 무엇이든 하라고
속삭인다. 이런 때를 만나 대학가는 축제를 연다. 우리 대학도 오늘부터 축제기간인 모양인데 예년의 축제를 참관해 보면 축제는 사라지고 흡사 시장판을 방불케 한다. 학과별로, 동아리별로 들떠있는 학우들을 유혹하여 술을 팔고 게임을 하고 쇼를 보여주고 물건을 사게 하여 한몫 챙기자는 심사가 너무도 짙게 깔려 있다. 술과 안주를 강요하는가 하면, 호객을 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을 마구 잡아끄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는 곳도 보인다.
필자가 한국 사회를 지켜보면서 가장 통탄해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지 10여 년 만에 이 논리가 내면화하여 한국인들 대다수가 물신주의와 상업주의의 포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교수들은 더 나은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연봉과 인센티브를 위해 연구를 하고, 학생들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공부한다. 그러니 축제를 시장판으로 바꾸는 것도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세 절대 왕정 시대에 봉건군주도 대학을 넘볼 수 없었던 것은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성역이자 진리욕의 실천도량이었기 때문이다. 상업주의로부터 가장 초연해야 할 대학마저 시장이 된다면 그 썩은 물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다.
어울림이 없는 것도 “왜 축제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되묻게 한다. 대학가 축제의 기원인 중세의 카니발(carnival)은 어울림의 장이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윤리와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날이었고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놀며 하나가 되는 날이다. 왕과 서민이, 이 동네 처녀와 저 동네 총각이 한데 어울려 밤새도록 춤을 추며 여러 놀이를 함께 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서로의 갈등은 사라지고 짝이 맺어지고 저절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의 축제는 ‘따로 국밥’이다. 교수 따로, 학생 따로, 동아리 따로, 학과 따로. 그러니 축제가 끝난 뒤에도 학과나 학교 분위기는 달라진 것이 없다. 총장과 교수와 직원, 학생이 한데 어울려 학교 문제와 인생을 고민하고 함께 공을 차고 술을 마시며 한양의 비전을 공유할 수는 없을까.
신선함, ‘낯설게하기’도 없다. 매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대학의 생명은 새로운 창조에 있다. 새로운 창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낯익고 자연스러운 것, 상투적인 것에 대한 반역이 있을 때 가능하다. 요즘의 축제에선 그런 반역을 구경하기 힘들다. 오늘의 대학과 내일의 대학이 똑같다면 그 대학은 하루 동안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오월의 교정은 너무도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담아 아름다운 축제, 더불어 함께 하는 축제, 새로움이 샘솟는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