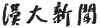규모가 크지 않은 한 대학에서 몇 달 사이에 네 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사태는 놀랍다. 그들의 자살이 하나같이 학업 부담, 성적 스트레스와 연관된다니, 스러져간 젊은 생명이 안타까우면서도 ‘우리나라 대학생들 공부 안 한다’는 속설이 어느새 옛 얘기가 된 건지 또 놀랍다.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학점 압박’이 3.0을 기준으로 모자라는 학점 0.01에 대하여 6만원의 수업료를 내도록 한다는 ‘징벌적 수업료’라는 제도였다는 대목 즈음에 이르면, 듣도보도 못한 이 ‘묘안’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경쟁적인 학점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일부의, 아니 상당수의 학생들은 3.0에 못미치는 학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들이 받게 되는 ‘나쁜 학점’은, 그 성적 때문에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그 자체가 충분한 징벌로 작용한다.
학교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끌어야지 낮은 성적을 돈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비교육적이다. 이보다는 ‘사회적 지탄’을 징벌로 간주해서 재벌 2세를 석방한 판사가 그 인격모독적인 폭력범에 대해서 훨씬 더 교육적인 판단을 내렸다. 교육적으로 판단해야 할 곳에서는 시장의 법칙을 적용하고,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되 엄격하게 그렇게 해야 할 곳에서는 따스한 교육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니 요즘 우리 사회 어디가 어딘지 참 어지럽다.
상식 밖의 일들이 이뿐이 아니며, 경악스러울 일들이 수차 되풀이되면서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 일쑤인 요즘 세상에서, 대학이라고 해서 이런 일들에서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의 병폐와 모순들이 학내에서 여과없이 적용되고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네 건의 자살 사건이 없었더라면 징벌적 수업료 제도 자체는 문제되지도 않은채 지나갔을 터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이런 제도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고 덤으로 학교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묘안으로 제안되고 학교 성원들의 큰 저항 없이 시행되어 왔다는 것은 부자되는 것이 공공연하게 만인의 삶의 지상 목표가 되어 있고 돈이 유일한 합리적 가치 척도로 간주되고 있는 속물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젊은이들의 값없는 죽음을 놓고 남의 일이라고 안도할 일은 아니거니와, 모든 대학이 시장적 경제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이라고 홀로 깨끗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렵다.
경쟁을 빙자한 또는 학업 장려를 빙자한 비교육적인 제도는 없는지, 앞서 가는 학생들을 채찍질하고 뒤쳐진 학생들을 보듬을 수 있는 ‘인간적인 경쟁’의 큰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경쟁적인 학점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일부의, 아니 상당수의 학생들은 3.0에 못미치는 학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들이 받게 되는 ‘나쁜 학점’은, 그 성적 때문에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그 자체가 충분한 징벌로 작용한다.
학교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끌어야지 낮은 성적을 돈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비교육적이다. 이보다는 ‘사회적 지탄’을 징벌로 간주해서 재벌 2세를 석방한 판사가 그 인격모독적인 폭력범에 대해서 훨씬 더 교육적인 판단을 내렸다. 교육적으로 판단해야 할 곳에서는 시장의 법칙을 적용하고,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되 엄격하게 그렇게 해야 할 곳에서는 따스한 교육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니 요즘 우리 사회 어디가 어딘지 참 어지럽다.
상식 밖의 일들이 이뿐이 아니며, 경악스러울 일들이 수차 되풀이되면서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 일쑤인 요즘 세상에서, 대학이라고 해서 이런 일들에서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의 병폐와 모순들이 학내에서 여과없이 적용되고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네 건의 자살 사건이 없었더라면 징벌적 수업료 제도 자체는 문제되지도 않은채 지나갔을 터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이런 제도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고 덤으로 학교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묘안으로 제안되고 학교 성원들의 큰 저항 없이 시행되어 왔다는 것은 부자되는 것이 공공연하게 만인의 삶의 지상 목표가 되어 있고 돈이 유일한 합리적 가치 척도로 간주되고 있는 속물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젊은이들의 값없는 죽음을 놓고 남의 일이라고 안도할 일은 아니거니와, 모든 대학이 시장적 경제의 광풍에 휩쓸리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대학이라고 홀로 깨끗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렵다.
경쟁을 빙자한 또는 학업 장려를 빙자한 비교육적인 제도는 없는지, 앞서 가는 학생들을 채찍질하고 뒤쳐진 학생들을 보듬을 수 있는 ‘인간적인 경쟁’의 큰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