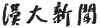학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3년 동안 진행했던 ‘다문화 교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프로젝트가 떠올랐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그리고 오늘 영화감독의 발표에서 언급된 장애인. 언뜻 보면, 동일선상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소재로 보인다.
당시 프로젝트 회의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인가였다. 다문화 사회를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을 평등하게 누리는 시공간에 사회 주변인에 해당하는 ‘소수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동의했다.
우리에게 다문화 사회란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민들이 증가한 사회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우리 사회의 주변인, 타자에 해당하는 소수자들을 모두 다문화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서 언급했던 장애인을 비롯해 성적 소수자, 새터민, 왕따생 등도 모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로 개선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변하고 있는 사회’를 교육과정 속에 끌어안는 바른 모습이라고 본다.
영화에서 장애인을 기피하듯 소설에서도 작중인물이 장애인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작품은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 주요섭의 <추물>, 하근찬의 <수난 이대> 정도가 되겠다. 70년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와서야 장애인 주인공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만큼 장애인은 은폐된 생활을 했다는 뜻이다.
장애인은 가족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존재이고, 사회는 이들의 존재를 부재한 상태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매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들을 보호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00년 95만8천196명에서 2005년 1백77만7천400명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 인구의 증가는 장애 범주가 확대됐고 장애인의 양상이 다양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애인을 더 이상 사회적 무 존재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간적 욕망을 지니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생에게 장애인에 대한 첫 인상을 물어 본 질문에 50.6%가 ‘무엇인가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 다음 29.2%는 ‘불쌍하다는 동정심이 들었다’는 대답을 했다. 청소년의 대부분도 장애인을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등의 편견을 지니고 바라봤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을 동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문제다.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을 대등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우리의 닫힌 마음도 열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하는, 삶의 질이 상향된 사회를 꿈꾸고 이루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