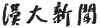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다. 가을인가 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빨갛게 익은 고추를 양지 바른 곳에 널어놓은 풍경을 아파트 단지나 골목 안 곳곳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물질문명이 팽배하여 삭막한 분위기만이 남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 고유의 민속적인 정감을 느낄 수 있는 풍경이다.
과거 우리의 가을 농촌 풍경에는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밭이 눈에 들어오고 이맘때면 초라한 초가지붕이나 그 뜰에는 여지없이 고추가 널려있었다.
그런데 정겹고 인정 많던 농촌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 도시화돼가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예전의 소박한 온정은 점점 식어갔다. 도시의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은 일찌감치 서구사회처럼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해 서로를 견제하고 남보다 우월해야 하는 약육강식의 특성대로 변모됐다. 공장이 들어선 농촌도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다.
누군가 그랬다. “이 세상이 낳은 병중에 가장 염려스럽고 무서운 것은 생존경쟁이라는 병이다”라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생존경쟁은 치열하고 각박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온 가을은 ‘생존경쟁’, ‘약육강식’의 단어들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다. 세상의 속된 모습들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기만 하다.
계절을 인간의 일생으로 비유하면 봄은 새순이 돋아나는 소년기, 여름을 약동하는 청년기라 할 수 있다. 가을은 무르익는 결실의 중년기로 표현할 수 있으며 겨울은 모든 수확을 끝내고 안식을 취하는 노년기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가을의 파란 하늘과 붉게 익어가는 파랗던 고추는 푸른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는 석양에 조화돼 가는 자연의 이치와 같다.
땀 흘려 풍요로운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농부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런 가을의 모습을 중년기에 비유한 것은 정말이지 탁월한 선택이다.
만물의 기운이 왕성한 여름의 녹음이 지나면 스산한 바람이 어깨를 스치고 산야의 나뭇잎은 수줍음 속에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이 다가온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 꼿꼿하던 허리도 휘어지고 그 모습도 나약해지지만 노송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자세가 의연해지고 고고해진다.
가을의 낙엽은 여름의 무성한 녹색 잎보다 그 빛깔이 현란하게 장식된다. 뿐만 아니라 가을에 낙엽 지는 나뭇잎들은 자유롭다. 언제 저렇게 다양한 리듬을 타고 공간 속을 난무한 적이 있는가.
죽어가는 이파리들은 살아있는 나비보다 더 가엾게 춤추며 땅위로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도 땅 속으로 스며들어 거름이 되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자신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연에 순응하며 후세를 위해 밑거름이 되는 헌신. 이것이 낙염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다.
낙엽을 보면 때로는 눈물이 나온다. 동정의 눈물도 소녀 같은 애상도 아니다. 이것은 초월하는 의지가 눈물겹다는 뜻이다. 사람도 나무처럼 살 수는 없을까? 기름진 거름이 돼 이 세상을, 이 대지를 살찌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간 위대한 위인이나 이름 없는 선구자들을 회상하며 풍성한 이 가을, 푸른 하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반성해 본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