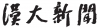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지난 2003년 여름의 일이다. 당시 우리학교에 수시 1차 시험을 보러 왔었다. 긴장하며 시험을 치르고, 어머님과 집에 돌아가기 위해 막 애지문을 향해가던 때였다.
참하게 생긴 한 여대생이 말을 거는 것이 아닌가. 수험생이던 2003년 그 당시, 한양대는 내가 가고 싶었던 원대한 꿈의 학교였다. 캠퍼스 안에서 누군가 내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일은, 당시 고3이던 내게 사뭇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심지어 선배라는 말에 심장은 더욱 두근두근. 마치 2차 면접관 앞에 선 양 발개진 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그 선배라는 분의 입에서 나온 한 마디의 비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맥이 탁 풀려버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윽고 이어지는 근처 교회청년부에 대한 설명. 특정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난, 그저 실망한 빛을 띄운 채 앞에 서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화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언니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내 팔을 끌어당겼다.
너무나도 오고 싶은 학교에 처음 발을 디딘 날,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한양대생’은 바로 ‘교회언니’였던 것이다.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순수하게 학구열에 불타는 대학 캠퍼스의 낭만 역시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기에 그 실망감은 더욱 컸다.)
바라던 학교에 운 좋게 입학하고 난 후에도 종종 그 ‘교회언니’를 캠퍼스 안에서 만났다. 언제나 언니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고, 강의를 듣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내 팔을 잡고, 수차례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하곤 했다. 항상 그 언니는 ‘그 분’을 만나지 못한 나를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겼다.
교회에 관심 없다는 말로도, 비아냥대는 말투로도, 심지어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말로도 언니의 설교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언니, 혹은 그 언니와 같은 누군가는 우리 캠퍼스를 활보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신의 종교를 타인에게 포교할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종교에의 자유를 인정하기에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더욱 보호돼야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다. 어째서 우리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캠퍼스 안에서 조차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아야 하는가.
현재의 교내 포교활동은 학교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학생들에게도 실제로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포교활동은 절대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소리 높여 말하고 싶다. 현재 이러한 강압적이고 피해를 주는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자중의 바람이 일기를 기대해본다.
박미나<법대·법학과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