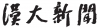온통 잿빛 건물에 둘러싸인 이 서울에서 이십년 남짓 살면서 그 나름의 감수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소리 덕분이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그 소리가 단순한 미학적인 질료가 아닌 실존의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에도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소리에서 차츰 미학적인 관념이 제거되기 시작했다. 바람에서 미학적인 상징이나 메타포가 제거되면서 남은 것은 피투성이 채로 서울의 한복판에 내던져진 처절한 실존의 모습이었다. 서울의 봄이 왜 이미지보다 먼저 바람 소리로 올 수밖에 없는지를 절실하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서울에서 길을 잃은 바람의 곡성이었던 것이다.
바람은 왜 서울에서 길을 잃은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가장 바람이 많은 곳을 가보면 된다. 여기저기서 생겨난 바람이 서로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서울의 ‘바람길’을 만드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람길’로 인해 서울의 하늘에 깃든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맑고 건강한 기운이 스며드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바람길’은 서울을 지켜온 것이다.
하지만 근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의 ‘바람길’은 그 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북한산과 도봉산의 바람은 상계동 일대의 대단지 아파트에 막혀 길을 잃었고, 한강의 바람 역시 강변을 따라 경쟁적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의해 길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아파트와 고층 건물과 각종 인공적인 시설물들로 인해 서울의 바람은 길을 잃고 헤매면서 때로 광폭해지기도 하고 또 기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바람길’의 혼란과 불경스러움은 고스란히 지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바람에 의해 자정이 되지 않은 각종 공해 물질들이 고스란히 지상의 사람들의 몸으로 스며들어 그들을 병들게 한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자연에 의지하려 한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엄청난 역설이다. 서울의 ‘바람길’을 훼손한 것은 인간의 욕망이다. 자연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것을 위해 자연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욕망 사이에는 제도적인 장치에 앞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욕망을 줄이고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자발적인 가난’이 없으면 훼손된 서울의 ‘바람길’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곧 봄의 불청객인 황사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다. 혼란 속에 있는 서울의 ‘바람길’에 더 힘세고 사악한 중국의 ‘바람길’이 겹쳐진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서울의 ‘바람길’은 세계로 통하고 또 그것을 넘어 우주로 통한다는 사실에 대한 뼈아픈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인류가 공생하는 길이 ‘바람길’에 있다는 생각을 이 봄날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류에게 바람은 더 이상 낭만의 대상이 아니며, 그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실존의 대상이라고.
이재복<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