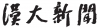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정현종 시인의 시를 아는가. 이 시는 단 두 문장의 짧은 시지만, 과연 우리들 주변을 단절하고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잔잔하다가도 성난 파도처럼 부서지기도 하는 인간 만사에서 우리가 다다라야 할 섬은 무엇일까?
한대신문 1567호를 펼쳤을 때, 갈등의 폭풍의 한가운데에 표류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지면 위로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곳에선 학생들의 공용공간을 두고 소통을 논하기도 하고, 육아 휴직 후 받았던 피해에 대해 권리를 되찾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넘어 환자와 의료시스템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도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투쟁인, 누군가에게는 필연적인 상처로 남게 될 전쟁터 속에서 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그 사이에 있는 섬들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그리고 그 섬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겹칠 수 없는 다른 공간에서 목소리를 힘써 내고 있다.
이번 신문을 찬찬히 읽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독자에게 소리치고 있고, 이것을 읽는 독자는 어떤 사실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앞으로 어떤 귀추가 나타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모아주고 위로할 힘은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모른 채로 미래에 기대를 걸고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우울의 늪에 빠져서 구조 요청할 의지마저 꺾인 이들도 있었다. 정갈하게 배치된 것처럼 보이는 행간이 어지럽게만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섬을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 건지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하면서 결국 끝 페이지로 도착했다. 정말 그 섬은 없는 것일까.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용기 내서 상황을 정리할 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모두를 감싸 안을 만큼 그릇이 큰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이 세태에 아주 조그마한 첨언을 하자면 ‘소통’의 회복력에 다시 주목하자고 말하고 싶다. 자신의 이해(利害)를 악착같이 추구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관심을 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욕심과 만용이 필연적으로 야기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서로의 손을 잡아줬던 것도 결국 인간이었으니 말이다.
가끔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양방향에서 도착하는 열차가 마주 보는 승강장이 아닌 합쳐져 있는 승강장을 볼 때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승강장을 섬식 승강장이라고 한다. 어지러이 오가는 열차의 방향에 상관없이 모두를 관통하여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섬, 도착지와 목적 방향은 서로 다르더라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섬의 존재가 우리의 발밑에 있었다. 어쩌면 소통과 연대가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섬에 있는 불성실한 등대지기는 밤새 먼 곳을 향해 비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 섬을 향해 밤새 헤엄쳐 가보자. 파도가 집어삼키더라도, 다음날이면 거짓말같이 잔잔해지고 흐릿한 형태가 해돋이에 잠깐 반짝일 때까지.
[독자위원회] 그 섬을 찾는 이들을 위해
- 김동혁<인문대 국어국문학과 18> 씨
- 승인 2023.06.05
- 호수 1568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