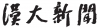한대신문의 보도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움을 자아냈다. 문제의식이 매우 뚜렷해서, 그리고 문장이 과감해서다. 다만 후자가 기성언론을,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악습을 답습하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됐다. 주장을 기사가 담보하는 객관성 뒤에 교묘히 숨기는, 제목과 본문을 가리지 않고 의도를 알게 모르게 드러내는 수법 말이다. 당연지사 구태여 그랬을리는 없겠으나, 보도면의 문장들이 뒷면 광장의 글들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문법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학보사에겐 커다란 딜레마라는 것을 안다. 기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거짓말이다. 문제의식에 자신이 있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비치는 것 역시 언론의 도리일 테다. 문제는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공공연한 팩트일지언정 가공하기 나름이고, 기사의 서술 방식에 따라 주장처럼 비칠 수 있다. 팩트체크조차 언론사별로 입맛에 맞는 소재만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객관적인 문장과 지표에 잘 녹여내느냐가 관건이고, 그렇기에 “보도 문장에 주장이 묻어나는 것은 그래도 자중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학교의 불통은 학생 대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학생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기자가 직접 보도에서 규정하는 것과,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낸 총학생회장의 말을 빌려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다. 인문사회계 연구 지원이 단편적인 지원에 그쳤다는 것을 인용 없이 ‘사실’이라고 서술하는 것과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말의 무게감이 다르다. 그 외에도 거의 모든 보도에 아웃트로식으로 의견을 첨가한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여운을 남기는 장치로 활용될 순 있겠지만, 대부분의 보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되려 의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싶다. 취재원 멘트, 객관적 자료, 주관처럼 보일 수 있는 단어 배제 등으로 충분히 중립의 구색을 갖출 수 있다. 독자는 언론의 불편부당함을 믿고 보도를 받아들이기에 더욱 세심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자사의 상징과도 같은 불편부당성 유지를 위해 기자의 주식 보유, 사적 관계, 개인적 발언까지 제약을 걸었다. 집요하게 학내 문제를 파고드는 한대신문의 과감함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언론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는 제언을 조심스레 건넨다.
설령 과감함을 잃지 않을까 두렵다면, ‘광장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대신문의 광장은 잘 꾸며 그 모습이 다채롭지만, 공간이 비좁고 코너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8면 발행을 감안했을 때 의견면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한대신문의, 나아가 한양대 구성원들의 투철한 문제제기를 객관적 문법으로 말해야 하는 보도면으로 전부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든다. 광장이 담아내지 못해 넘쳐흐른 주장들이 보도면을 침범하지 않게끔 광장을 정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학내 사설을 신설하거나 칼럼 코너의 정체성을 명확히 잡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백 마디의 수사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번 호는 기획이 있었음에도 사진이 비중있게 실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다. 아울러 신문 구성이 5단이 대부분이었음에도 1단만 차지하는 사진의 비중이 컸다. 글 기사를 치장하는 정도를 넘어, 사진 한 장만으로도 임팩트있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