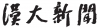지난 3월 21일과 2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가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시위가 중단된 지 1달여 만이다.
지하철은 장애인 교통 사각지대임이 분명하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있어 연단 간격 10cm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최소 조건이다. 하지만 이 간격이 가장 넓은 곳은 성신여대입구역, 28cm다. 승강장 발빠짐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한 ‘10cm 룰’은 유명무실하다. 개정된 「도시철도법」은 지난 2005년 이후 건설된 역에만 해당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이전 준공 역사는 안전발판 설치 규정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 관할의 296개 역 중 무려 268곳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10cm 이상 승강장은 총 3천607곳, 결국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장애인은 매번 끼임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하철에 오르고 있다. 장애인은 생존을 위해 이동권 투쟁에 나서는데 이들 앞에서 성숙한 시위가 무슨 소용인지 도리어 묻고 싶다.
이들 장애인 단체가 이 시위로 우리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 비장애인들도 된통 당해봐라’가 아니다. 승강장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발판을 마련해달란 절박한 외침이다. 갑자기 등장한 시위도 아니다. 지난 2001년부터 이어져 왔다.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우리 사회는 도대체 무얼했단 말인가.
특히 이들 시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이 제1야당의 당대표를 통해 나오고 있다. ‘시민을 볼모로한 시위’ ‘전장연의 독선과 아집’이란 프레임을 조성한 뒤 정치권의 책임을 회피하고 장애인 단체를 향한 혐오적인 발언과 분위기를 수없이 양산하고 있다. 장애인 시위를 정치 투쟁으로 호도하는 정치인은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시민들을 그의 표현대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담론을 벌이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장애인을 향한 혐오 발언에 찌든 모습은 비단 정치권에서만 드러난 것은 아니다. 우리 대학 사회 곳곳에서도 시위를 향한 불평불만과 함께 곁들인 혐오 발언은 점차 장애인을 향한 배제로 나아가고 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주 이동수단인 지하철을 막아서고 시위를 하는 건 성숙한 시위가 아니다’, ‘이 시위 때문에 학교에 30분을 지각했다’ 등의 발언은 장애인이 겪었을 무수한 고통엔 무감각한 채 자신의 편익에만 치우쳐 쏟아낸 실언에 불과하다. 장애인 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은 58분, 우리가 출퇴근, 등하교를 위해 나선 길에서 이들 시위로 지연된 시간을 이들의 기다림에 비교할 수 없다.
지성의 전당이란 대학에서 이들을 포용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한다. 장애인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0년째 이어지는 이들의 외침에 우리 대학 사회의 지성인들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10cm의 크레바스,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선
- 한대신문
- 승인 2022.04.04
- 호수 1545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