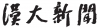지난 14일, 구로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접근금지 대상인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김병찬 사건, 이석준 사건에 이어 석 달 동안 벌어진 스토킹 보복 범죄만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 없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당 법률은 스토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대로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실상은 가벼운 솜방망이식 대처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스토킹 행위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신 금지 명령’ 등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는 위반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렵고, 발각되더라도 과태료 300만 원에 그칠 뿐이다. 또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목적으로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도 피해자들을 지켜내긴 역부족이다. 긴급 상황에서 스마트워치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가 전송된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의 영역에 들어온 가해자가 돌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데 스마트워치를 아무리 눌러봐야 늑장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스토킹 보복 범죄의 핵심은 가해자의 보복 범죄 발생이 높은 시간, 일명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지만 피해자를 지켜내기엔 유명무실한 조치에 불과하다.
검·경 역시 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스토킹 범죄를 바라보는 두 기관의 안일한 시선 때문이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가 늘었다고 하지만, 문제는 신고해도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는 데 있다. 실제로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접수된 3천 개의 신고 중 입건된 사건은 고작 8%였다. 처벌을 위해 법을 만들었건만, 정작 신고 대부분이 경찰 선에서 이미 입구컷 당하는 상황인 것이다. 여러 차례 들어온 신고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경찰은 도대체 어떤 범죄를 ‘사건’으로 보는 건지 의문스럽다.
입건이 돼도 수사가 제대로 굴러가는 건 아니다. 최근 구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경찰은 스토킹 위험도를 ‘심각’으로 분류했지만, 정작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진 않았다.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가해자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협해 이미 신고가 여러 번 이뤄졌지만, 검찰은 범죄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를 하는 사이 범죄가 발생했다. 초동수사가 매우 중요한 스토킹 범죄에서 검·경의 부진한 인식과 미적지근한 대처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참극을 부추긴 꼴이다.
법과 검·경간 엇박이 계속되니 피해자를 구제할 곳은 어딘지 궁금하다. 희생자가 발생해야 조처를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반복이다. 현재 국회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입법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10개의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완 입법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검·경의 인식도 함께 변화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스토킹 범죄로 여성 살해가 벌어지는 걸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사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죽어서야 보호받을 권리가 생긴다
- 한대신문
- 승인 2022.03.02
- 호수 1542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