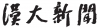글을 쓸 때 ‘감정의 기억’이란 몹시 소중하다. 나이가 들며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질 순 있지만, 그때의 풋풋한 감정을 가슴속에 간직한 사람은 추억이 가져오는 온기로 그다지 춥지 않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별을 바라보거나 기타 선율에 끌리는 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잠깐이며 그건 아주 귀한 경험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아(自俄)를 견디는 일이며 또한 비아(非俄)를 인내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늘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이별하기도 하지만 이는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상실의 아픔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겪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상실을 재생하는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선 상실에서 겪게 되는 아픔에 대해 ‘모든 사물과 나 자신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과거 한 사건을 통해 필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아마 이때 발생했던 감정의 오류는 상대방에 대한 오랜 신뢰와 고독한 배려에 기인한 필자의 비현실적인 기대감과 무의식적 억압이 빚어낸 듯하다. 그렇게 묵직한 무언가가 짓누르는 무게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괴로워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계속됐다.
끝도 없던 공허함과 상실감은 과연 지나간 시간이 해결한 것일까 혹은 시간이 흘러 껍질이 단단해진 필자가 해결한 것일까.
사실 필자가 한 것이라곤 스스로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서 꾸미지 않은 필자의 모습을 보며 내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뿐이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관망하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신체적 반응, 행동 등을 근거로 자신의 신념과 사고 체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자신에게 나타난 현상을 인지하고 그 내면으로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비로소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그것의 기저에는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있는지, 또 이를 가능하게 한 내면의 관념과 신념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혹은 프로이트가 말했던 방어기제가 작용해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다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무던히도 인내하고 억누르며 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연에 해가 쨍쨍할 때도 때론 비가 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슬픔, 기쁨, 분노 이 모든 감정은 꼭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엔 원인이 있다. 다만 이는 항상 변하기 쉬운 날씨와도 같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매 순간 우리는 감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변화를 느끼며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 사건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 모든 현상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탐색을 하다 보면 엉켜있던 나의 감정들에 차분히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온전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감정은 미래의 우리에게 관망의 지혜가 되어 ‘감정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감정이 가져오는 기억은 나에게 집중하기 위한 귀중한 연료다. 그 누구도 나의 깊이를 나만큼 알 수는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