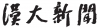문상객의 코끝이 상주의 발끝에 닿을 지경이었다 구두를 벗으면 회색 양말이 발가락만 까맣게 물들었다
고인은 잠버릇이 나빴다 이불을 걷어차고 밤새 뒤척이고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육백 년은 살 것처럼 굴더니 환갑도 다 채우지 못했다 명색이 무색한 소나무 침상이었다 속에는 봄꽃을 그득 채웠다 독초를 거르느라 품이 들었다 굴러가지 못하게 꽁꽁 묶었다
서너 살 먹은 늦둥이가 있었다 아는 얼굴이라고 깔깔 웃었다 머리부터 고꾸라지며 절을 했다 배꼽인사였다 말갛게 웃기만 했다
교복 입은 애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하나는 빌린 양복에 상장을 찼다 영정 앞에 국화가 수북했다 반장쯤 되는 애가 대표로 헌화했다 주머니 밖으로 리본 달린 포장지가 튀어나와 있었다 향을 들고 훅 하니 불었다가 제풀에 놀라서 내려놓았다
식장은 산중에 있었다 가로등도 없는 밤중이었다 객들은 제때 돌아가지 못했다 화투를 치고 육개장을 마셨다 밤을 새울 양이었다 그러다 술잔을 들고 달려왔다 달뜬 얼굴들이었다 어깨를 흔들고 따귀를 때렸다 빈 잔에 꽃잎 한 잎 떨어졌다 영정에다 대고 화투짝을 던졌다 딱, 하고 붙었다 흑싸리라고, 다시 시작이라고 소리를 쳤다 뒤척이지 않았다 때늦은 사월이었다
저작권자 © 한대신문 :: 빛나는 예지, 힘찬 붓줄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